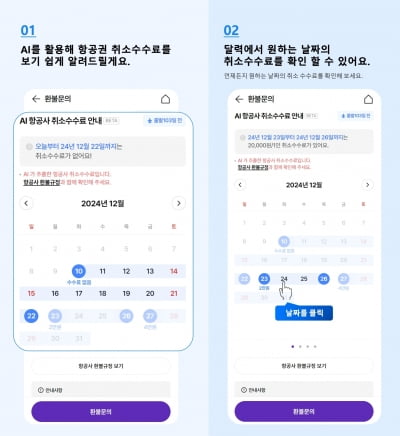[대둔산] 구름다리 건너면 오메! 단풍들것네 .. 곳곳 기암괴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땅의 가을은 시골길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다.
고속도로의 속도신화에 눌려 늘 뒷전인 이름없는 길가의 요즘 가을색 만큼 청량하고 따사로운게 없다.
씨뿌리고 거둬들이며 가슴열어 어울리는 "사람냄새"가 풀포기 나무그루마다 색색으로 매달려 한층 여유롭다.
코흘리개까지 포함해 예닐곱명을 태운 조금은 낡은 시외버스.
대전에서 대둔산을 향해 635번 지방도에 오른 시외버스 바깥 풍경이 꼭 그랬다.
구불구불한 길을 가운데 두고 내내 흐르는 나직한 산줄기가 너그러웠고 손대면 깨질 것 같은 유등천 좁은 물길과 쪽빛 하늘이 마냥 투명했다.
빨갛고 노랗게 익은 가을의 결실, 빛이 바래기 시작한 산자락의 삶터는 가을을 예찬하는 노래소리처럼 푸근한 화음을 이루었다.
서두를 것 없지 않느냐는 투의 느릿한 버스엔진 소리가 더해져 탁트인 들녘길을 내달릴 때와는 사뭇 다른 감흥을 돋웠다.
어느새 17번 국도변의 충남 금산군 진산땅.
조선 정조때 신해교란(辛亥敎亂)으로 순교한 선비 윤지충이 이곳 사람이라고 한다.
진산땅을 지나 도계표지가 분칠한 배티재를 넘자마자 닿은 곳이 전북 완주쪽의 대둔산 들머리다.
대둔산(878m)의 원래 이름은 한듬산.
우리말로 크다는 뜻의 "한", 두메 더미란 의미의 "듬"이 합해진 것.
계룡산과 모습이 비슷한데 산태극 수태극의 명당자리를 빼앗긴게 분해 "한이 든 산"이란 뜻의 한듬산이라 했다고도 전한다.
대둔산은 이 한듬산의 한자표기로 굳혀진 것이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오른다는 완주쪽의 산행길은 뾰족돌과 바위의 연속.
높은 편은 아니고 길도 잘 내놓았지만 가파른 경사면이 많아 쉽지는 않은 코스다.
30여분을 쉼없이 올라 만난 것은 동심바위.
신라 문무왕때 원효대사가 감탄해 3일동안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거대한 입석바위다.
솜씨좋은 석공이라면 조금만 손을 대도 당당한 석(石)장군이 나올것 같은 모습이다.
조금 더 오르자 까마득히 높은 곳에 걸려 있는 다리가 보였다.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잇는 높이 81m, 폭 1m, 길이 50m의 금강구름다리다.
대둔산 산행의 맛을 더해주는 구조물중의 하나다.
금강구름다리는 그러나 손에 잡힐듯 하면서도 멀리 있다.
땀 한사발을 더 흘리며 금강문을 거슬러 올랐다.
금강구름다리는 정말 구름위를 걷는 듯 시원하고 장쾌한 느낌을 주었다.
잇닿아 있는 삼선철사다리 앞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삼선바위에 경사도 51도로 걸쳐 있는 길이 36m, 1백27계단의 구름사다리.
올라가다 뒤를 보면 꼼짝없이 몸이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눈을 감은채 두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무작정 발을 놀리는 수 밖에는 없다.
삼선바위 꼭대기에 올라 큰 숨으로 가슴을 진정시키고 뒤로 이어진 길을 따랐다.
조금은 밋밋한 정상삼거리에서 왼쪽 방향.
드디어 대둔산 최고봉인 마천대다.
나뭇잎으로 덮인 산행길에서의 좁은 시야가 넓게 트였다.
오르내리는 케이블카가 성냥갑 같이 작았다.
금강구름다리 삼선철사다리는 그 속에서 튀어나온 성냥개비처럼 보였다.
금남정맥의 산군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다른 편으로는 낮은 구릉과 분지가 끝없이 펼쳐졌다.
공원들머리에서 식당을 하는 김흥식씨가 들려준 계백장군 이야기가 떠올랐다.
17번 국도를 타고 아래로 2km쯤 떨어진 곳의 갈림길로 오르는 숯고개(쑥고개).
말 한필밖에 다닐수 없었다는 이 고개가 백제의 전략요충으로 꼽혔던 탄현이다.
백제는 그러나 탁상공론을 벌이다 이 고개의 가치를 외면했고 신라 5만군사는 배티재~숯고개~용개산성 옛길을 무혈돌파했다.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선 계백의 5천 결사대는 중과부적으로 패퇴,백제의 몰락이 앞당겨졌다는 설명이다.
개발이란 이유로 깎이고 잘려 벌건 속살을 드러낸 일부 산자락의 모습이 더욱 안쓰러워졌다.
산을 더 깎고 헐어내 아예 망가뜨릴지 아니면 삽질을 멈춰 더이상의 훼손을 막을지 정론에 따른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고속도로의 속도신화에 눌려 늘 뒷전인 이름없는 길가의 요즘 가을색 만큼 청량하고 따사로운게 없다.
씨뿌리고 거둬들이며 가슴열어 어울리는 "사람냄새"가 풀포기 나무그루마다 색색으로 매달려 한층 여유롭다.
코흘리개까지 포함해 예닐곱명을 태운 조금은 낡은 시외버스.
대전에서 대둔산을 향해 635번 지방도에 오른 시외버스 바깥 풍경이 꼭 그랬다.
구불구불한 길을 가운데 두고 내내 흐르는 나직한 산줄기가 너그러웠고 손대면 깨질 것 같은 유등천 좁은 물길과 쪽빛 하늘이 마냥 투명했다.
빨갛고 노랗게 익은 가을의 결실, 빛이 바래기 시작한 산자락의 삶터는 가을을 예찬하는 노래소리처럼 푸근한 화음을 이루었다.
서두를 것 없지 않느냐는 투의 느릿한 버스엔진 소리가 더해져 탁트인 들녘길을 내달릴 때와는 사뭇 다른 감흥을 돋웠다.
어느새 17번 국도변의 충남 금산군 진산땅.
조선 정조때 신해교란(辛亥敎亂)으로 순교한 선비 윤지충이 이곳 사람이라고 한다.
진산땅을 지나 도계표지가 분칠한 배티재를 넘자마자 닿은 곳이 전북 완주쪽의 대둔산 들머리다.
대둔산(878m)의 원래 이름은 한듬산.
우리말로 크다는 뜻의 "한", 두메 더미란 의미의 "듬"이 합해진 것.
계룡산과 모습이 비슷한데 산태극 수태극의 명당자리를 빼앗긴게 분해 "한이 든 산"이란 뜻의 한듬산이라 했다고도 전한다.
대둔산은 이 한듬산의 한자표기로 굳혀진 것이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오른다는 완주쪽의 산행길은 뾰족돌과 바위의 연속.
높은 편은 아니고 길도 잘 내놓았지만 가파른 경사면이 많아 쉽지는 않은 코스다.
30여분을 쉼없이 올라 만난 것은 동심바위.
신라 문무왕때 원효대사가 감탄해 3일동안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거대한 입석바위다.
솜씨좋은 석공이라면 조금만 손을 대도 당당한 석(石)장군이 나올것 같은 모습이다.
조금 더 오르자 까마득히 높은 곳에 걸려 있는 다리가 보였다.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잇는 높이 81m, 폭 1m, 길이 50m의 금강구름다리다.
대둔산 산행의 맛을 더해주는 구조물중의 하나다.
금강구름다리는 그러나 손에 잡힐듯 하면서도 멀리 있다.
땀 한사발을 더 흘리며 금강문을 거슬러 올랐다.
금강구름다리는 정말 구름위를 걷는 듯 시원하고 장쾌한 느낌을 주었다.
잇닿아 있는 삼선철사다리 앞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삼선바위에 경사도 51도로 걸쳐 있는 길이 36m, 1백27계단의 구름사다리.
올라가다 뒤를 보면 꼼짝없이 몸이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눈을 감은채 두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무작정 발을 놀리는 수 밖에는 없다.
삼선바위 꼭대기에 올라 큰 숨으로 가슴을 진정시키고 뒤로 이어진 길을 따랐다.
조금은 밋밋한 정상삼거리에서 왼쪽 방향.
드디어 대둔산 최고봉인 마천대다.
나뭇잎으로 덮인 산행길에서의 좁은 시야가 넓게 트였다.
오르내리는 케이블카가 성냥갑 같이 작았다.
금강구름다리 삼선철사다리는 그 속에서 튀어나온 성냥개비처럼 보였다.
금남정맥의 산군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다른 편으로는 낮은 구릉과 분지가 끝없이 펼쳐졌다.
공원들머리에서 식당을 하는 김흥식씨가 들려준 계백장군 이야기가 떠올랐다.
17번 국도를 타고 아래로 2km쯤 떨어진 곳의 갈림길로 오르는 숯고개(쑥고개).
말 한필밖에 다닐수 없었다는 이 고개가 백제의 전략요충으로 꼽혔던 탄현이다.
백제는 그러나 탁상공론을 벌이다 이 고개의 가치를 외면했고 신라 5만군사는 배티재~숯고개~용개산성 옛길을 무혈돌파했다.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선 계백의 5천 결사대는 중과부적으로 패퇴,백제의 몰락이 앞당겨졌다는 설명이다.
개발이란 이유로 깎이고 잘려 벌건 속살을 드러낸 일부 산자락의 모습이 더욱 안쓰러워졌다.
산을 더 깎고 헐어내 아예 망가뜨릴지 아니면 삽질을 멈춰 더이상의 훼손을 막을지 정론에 따른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