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같은 직접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은행의 기업금융기능마저 기형화되고 종금사도 해체수순을 밟음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은행 대출 가운데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68.4%에서 6개월새 65.9%로 축소됐다.
돈이 몰려들고 있는 주택 국민은행 등 소매금융 은행과 우체국은 기업금융에 대한 경험 부족과 가계금융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기업에 자금을 제대로 중개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 국민은행의 올 상반기중 예금증가액은 18조원에 달한다.
이중 기업에 대출한 돈은 두 은행을 합해 3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가계대출은 5조7천억원을 늘렸다.
특히 국공채 투자와 금융기관 대출(콜론) 등 재테크엔 기업 대출의 두배에 달하는 6조4천억원의 돈을 쏟아부었다.
주택과 국민은행의 자산 대비 국공채 투자 비율은 각각 14.7%와 11.1%로 조흥(8.7%) 한빛(7.6%)은행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기업금융 노하우가 풍부한 조흥 한빛 외환은행의 경우 2차 금융 구조조정을 앞두고 BIS 비율이란 족쇄에 묶여 기업대출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과 제일은행은 아예 소매전문 은행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선 금융기관의 산업대출 비중이 높아 금융권의 대출전략 변화가 기업 자금조달에 큰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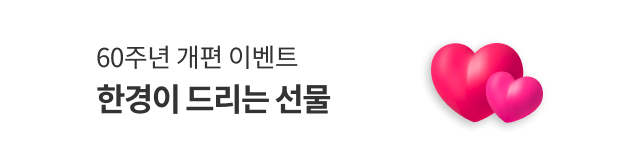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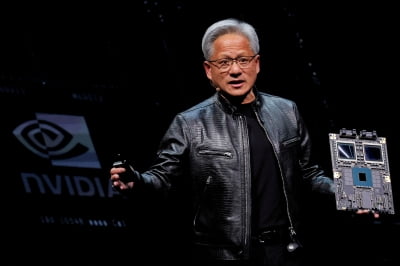





![[단독]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10조 사업' 날린 이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92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