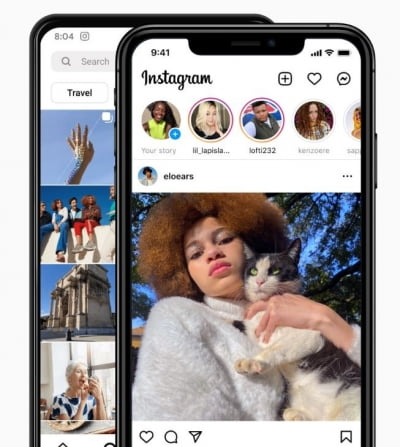[IMT-2000] 4龍3珠...社運건 한판승부..한통/SK/LG 유리한 고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1세기 통신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티켓을 잡아라"
통신업계는 지금 IMT-2000 사업권 확보를 위한 대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LG그룹,한국IMT-2000컨소시엄 등 4개 그룹.그러나 사업권 티켓은 3장으로 한정돼 있다.
마치 3개의 진주를 놓고 4마리의 용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현재로선 이른바 통신업계 "빅3"으로 불리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LG그룹이 IMT-2000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지에 가장 근접해 있다.
반면 이들 빅3에 대항해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중소.벤처기업들이 연합한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으나 사업권 확보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신 =명실공히 국내 최대 기간통신 사업자이다.
최근 한솔엠닷컴을 인수해 자회사인 한국통신프리텔과 함께 무선 부문에서도 8백만명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한통은 IMT-2000을 계기로 유선은 물론 무선 시장에서도 절대강자를 꿈꾸고 있다.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은 "오는 2003년께면 무선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을 추월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자금력과 기간망,그룹력 등에서 SK텔레콤에 뒤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통신이 사업권을 따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최근 이슈로 떠오른 기술표준이 한통의 고민거리다.
여러가지 면을 따져 비동기식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으나 정통부는 물론,경쟁사의 방해가 만만찮다.
<>SK텔레콤 =무선부문에서 이미 절대강자의 위치에 올라있다.
지난해 이동전화업계 3위인 신세기통신을 인수해 1천4백만명이상의 가입자를 고객으로 갖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이동전화 사용자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쉽게말해 전체 국민의 3명당 1명꼴로 SK텔레콤의 011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의 사업권 확보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의 고객을 IMT-2000에서도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게 SK텔레콤의 바람이다.
그러나 SK텔레콤 역시 고민거리가 있기는 마찬가지.정통부가 컨소시엄 구성을 사실상 의무화시키자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별도법인을 세워야 하는데 별도법인을 세우는데 따른 자금부담,새로운 법인과 현재의 SK텔레콤과의 관계,출자총액한도로 별도법인에 대한 지분한계,주주분산에 따른 부작용 등 걸리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LG그룹 =이동전화 사업자인 LG텔레콤과 장비업체인 LG정보통신,지난해 인수한 유선 사업자 데이콤 등 "3박자"를 고루 갖췄다.
여기에다 그룹에서도 정보통신 부문을 21세기 대표적인 수종사업으로 지목해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력에서 한국통신 및 SK텔레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다.
그러나 LG그룹의 고민은 현재 이동전화 시장에서 LG텔레콤이 "빅3"중 맨 꼴찌에 있다는 것.더욱이 가입자수에서 SK텔레콤 및 한국통신과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
따라서 IMT-2000을 계기로 지금의 통신구도를 뒤엎자는 게 LG그룹의 욕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3위라는 수모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LG그룹은 그 전략의 하나로 비동기 기술방식을 내세웠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해보겠다는 것이다.
LG그룹은 또 하나로통신 파워콤 등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 =하나로통신 온세통신에다 10개 무선호출사업자,TRS(주파수공용통신)사업자,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 소속 2백여개 회원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사,케이블TV사업자(SO) 등이 참여해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가 사업자선정방침에서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신규사업자용 티켓을 보장하지 않아 기존 "빅3"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거대 사업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서는 승산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최근 전략을 바꿨다.
기존 중소.벤처기업 위주에서 자본력과 실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해외사업자와 손을 잡고 "빅3"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그러나 새로운 전략이 의도대로 먹혀들지는 아직 의문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통신업계는 지금 IMT-2000 사업권 확보를 위한 대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LG그룹,한국IMT-2000컨소시엄 등 4개 그룹.그러나 사업권 티켓은 3장으로 한정돼 있다.
마치 3개의 진주를 놓고 4마리의 용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현재로선 이른바 통신업계 "빅3"으로 불리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LG그룹이 IMT-2000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지에 가장 근접해 있다.
반면 이들 빅3에 대항해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중소.벤처기업들이 연합한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으나 사업권 확보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신 =명실공히 국내 최대 기간통신 사업자이다.
최근 한솔엠닷컴을 인수해 자회사인 한국통신프리텔과 함께 무선 부문에서도 8백만명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한통은 IMT-2000을 계기로 유선은 물론 무선 시장에서도 절대강자를 꿈꾸고 있다.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은 "오는 2003년께면 무선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을 추월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자금력과 기간망,그룹력 등에서 SK텔레콤에 뒤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통신이 사업권을 따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최근 이슈로 떠오른 기술표준이 한통의 고민거리다.
여러가지 면을 따져 비동기식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으나 정통부는 물론,경쟁사의 방해가 만만찮다.
<>SK텔레콤 =무선부문에서 이미 절대강자의 위치에 올라있다.
지난해 이동전화업계 3위인 신세기통신을 인수해 1천4백만명이상의 가입자를 고객으로 갖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이동전화 사용자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쉽게말해 전체 국민의 3명당 1명꼴로 SK텔레콤의 011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의 사업권 확보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의 고객을 IMT-2000에서도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게 SK텔레콤의 바람이다.
그러나 SK텔레콤 역시 고민거리가 있기는 마찬가지.정통부가 컨소시엄 구성을 사실상 의무화시키자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별도법인을 세워야 하는데 별도법인을 세우는데 따른 자금부담,새로운 법인과 현재의 SK텔레콤과의 관계,출자총액한도로 별도법인에 대한 지분한계,주주분산에 따른 부작용 등 걸리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LG그룹 =이동전화 사업자인 LG텔레콤과 장비업체인 LG정보통신,지난해 인수한 유선 사업자 데이콤 등 "3박자"를 고루 갖췄다.
여기에다 그룹에서도 정보통신 부문을 21세기 대표적인 수종사업으로 지목해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력에서 한국통신 및 SK텔레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다.
그러나 LG그룹의 고민은 현재 이동전화 시장에서 LG텔레콤이 "빅3"중 맨 꼴찌에 있다는 것.더욱이 가입자수에서 SK텔레콤 및 한국통신과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
따라서 IMT-2000을 계기로 지금의 통신구도를 뒤엎자는 게 LG그룹의 욕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3위라는 수모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LG그룹은 그 전략의 하나로 비동기 기술방식을 내세웠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해보겠다는 것이다.
LG그룹은 또 하나로통신 파워콤 등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 =하나로통신 온세통신에다 10개 무선호출사업자,TRS(주파수공용통신)사업자,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 소속 2백여개 회원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사,케이블TV사업자(SO) 등이 참여해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가 사업자선정방침에서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신규사업자용 티켓을 보장하지 않아 기존 "빅3"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거대 사업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서는 승산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최근 전략을 바꿨다.
기존 중소.벤처기업 위주에서 자본력과 실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해외사업자와 손을 잡고 "빅3"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그러나 새로운 전략이 의도대로 먹혀들지는 아직 의문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계엄 후 하루만에 3000만원…김어준 슈퍼챗 '쏠쏠'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3.1368017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