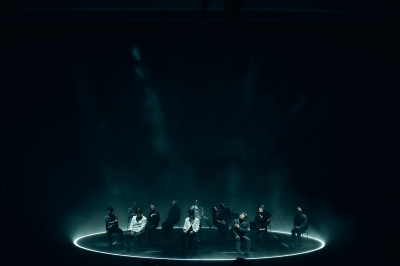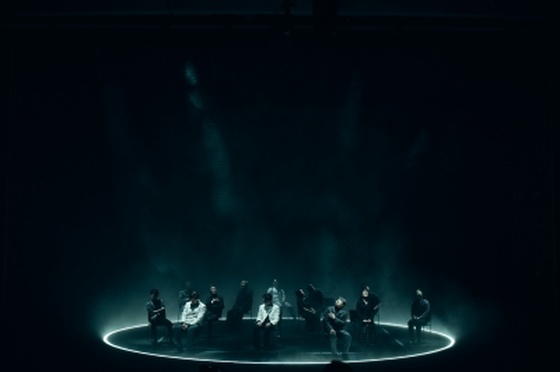숨이 '턱' 막힌 사랑이여 .. 최갑수 첫 시집 '단 한번의 사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인 최갑수(27)씨의 첫시집 "단 한 번의 사랑"(문학동네)은 맑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다.
요즘 시들이 장황하고 파편적인데 비해 그의 노래는 짧고 함축적이다.
새 세기의 빛을 향해 모두들 앞만 보고 달릴 때 그는 혼자 돌아서서 지나온 날들의 어둠과 그림자를 잰다.
그의 시에는 태양보다 달,빛보다 그늘,남성보다 여성,낮보다 밤의 이미지가 더 많이 등장한다.
여러가지 사물의 모습도 실체를 가진 이름보다 아슴한 윤곽으로 대체되어 있다.
그러나 행간마다 섬세한 감성의 올이 촘촘하게 엮여있다.
투명한 시어와 생동감 있는 리듬이 어우러져 한폭의 수묵담채화를 보는 듯하다.
그는 어떤 것을 규정지으려 들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내면의 무늬를 한 겹씩 펼쳐놓은 다음 그것으로부터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려 한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론으로 돌아가 우주의 뿌리에서 삶의 줄기와 잎들을 새로 뽑아 올리는 것처럼 근원적이다.
요즘같은 속도의 시대에 그가 보여주는 느림의 미학은 이런 점에서 탁월하다.
새로운 세기로 성급하게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깊이있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의 화살이 겨냥하는 과녁은 바로 그의 내부에 있다.
"그 옛날 푸르게 너를/감싸안았던 커다란 잎사귀들/이제는 너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렸구나"("후허하오터의 선인장")라든지 "나를 아프게 한 건 다름 아닌 나였구나"("온몸을 봄산에 기댄 채")라는 자각이 이를 뒷받침한다.
등단작품 "밀물여인숙"(1997년 "문학동네" 하계문예공모 당선작) 연작에서 그가 보여줬던 자세도 그렇다.
그는 세계의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경계에서 썰물이 아니라 밀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이다.
"외진 몸과 몸 사이/하루에도 몇 번씩/높은 물이랑이 친다/참 많이도 돌아다녔어요,/집 나선 지 이태째라는 참머리 계집은/잘근잘근 입술을 깨물며/부서진 손톱으로/달을 새긴다/장판 깊이 박히는 수많은 달"("밀물여인숙1"부분) 이럴 때 몸과 몸은 "섬"의 수평적 이미지로 치환된다.
그 위에서 부서진 손톱과 달,허름한 장판이 "밤하늘"의 수직적 이미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같은 상상력은 "바다에 괴롭고/삶에 괴로운/서글픈 눈매의 까까머리 청년"으로부터 "커다란 눈을 가진 심해어"("버드나무 선창")로 확장되는 자의식과 연결된다.
그의 성찰은 걸쭉하게 체화된 생활시편에서도 잘 발현된다.
며칠째 알을 낳지 않고 살도 붙지 않는 닭들을 돌보며 "아버지가 차려놓은 밥상을/모이 쪼듯 콕콕 쪼아먹"던 시절,"노랗게 곪아가던 내 잠 속의 무정란"과 "붉은 벼슬을 세우고/서서히 우리를 목 졸라"("양계장")오던 밤은 곧 동시대인들의 고뇌를 대변한다.
그 어둠의 끝에서 "격랑의 사막을 건너가야 하는/약관의 비루한 낙타"("후허하오터의 달")가 출발한다.
세상의 모래밭 위로 밀물처럼 스며드는 바다의 숨소리와 알전구같은 달빛이 비칠 때,시인은 우리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난 세기의 높낮이와 삶의 굴곡을 찬찬이 되새겨보라고 권한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냄새도 연기도 없다" 입소문…없어서 못 파는 '신종 담배'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46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