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미국, 인터넷 보안/윤리 조기교육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비례해 사이버공간상의 해킹이나 사생활침해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미국정부와 각급 학교는 이에따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윤리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체득하도록 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 법무부는 해킹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동들을 막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30만달러를 시드머니(종자돈)로 책정했다.
법무부는 각급학교에 컴퓨터 윤리교육을 위해 이 돈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컴퓨터 범죄담당 책임자인 마타 스탠셀.G는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는데 조기 윤리교육 만큼 강력한 수단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세계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행동들이 사이버공간에서는 버젓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E메일(전자우편)을 훔쳐보는 행위가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를 깨우쳐 주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공간이 실제세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해킹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범인을 쉽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술적인 지식이 가장 큰 무기로 통하는 것도 실제 세계와 구별되는 점이다.
사이버공간상의 규범과 윤리의 도덕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야후 e-베이 등 세계적인 인터넷업체들의 웹사이트들이 해커들의 공격으로 수시간이나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
아직까지 해커들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으며 언제 이러한 사태가 또 재발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 서부 푸듀대학에서 윤리학을 강의하는 폴 톰슨 교수(철학과)는 "우리의 생활을 규정짓는 규범들은 우리가 실제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을 때에만 존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이버세계에서는 상호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규범들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진단했다.
톰슨 교수는 특히 "정보기술로 무장한 인터넷세대들은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나쁜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없다면 자신들의 행동을 그만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신시내티 컨트리데이스쿨은 5학년이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조그만 랩톱컴퓨터를 하나씩 지급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내의 네트워크나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6학년이 되면서부터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1년간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들에 관해 교육을 받는다.
이 학교 6학년 담당교사인 안나 해틀은 "기본적인 에티켓은 물론이고 앞으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도 주의깊게 다뤄야 할 저작권보호나 지식재산권 상표권문제 등을 교육 커리큘럼 속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인터넷도 지켜야 할 규범이 있는 또 하나의 세계임을 인식해 나간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카카오, 행정처분 안 따라"…공개 비판한 개인정보위 [정지은의 산업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32855404.3.jpg)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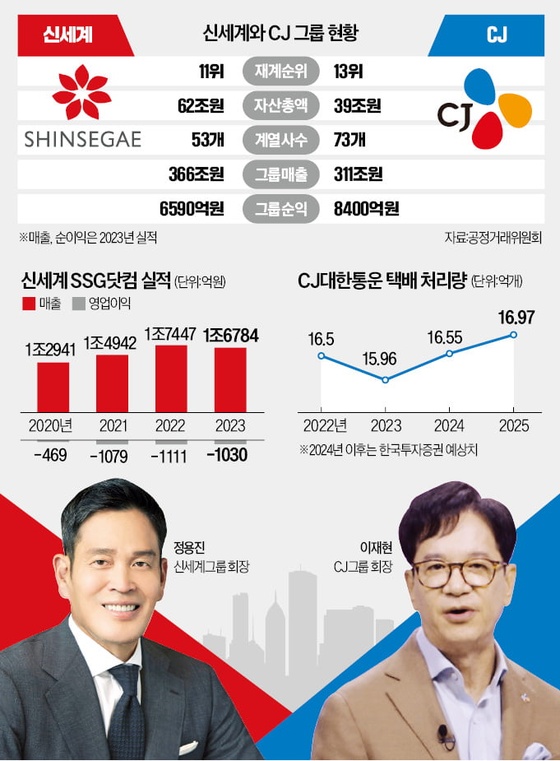





![[신간] 주정뱅이 연대기·엄마 아닌 여자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5428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