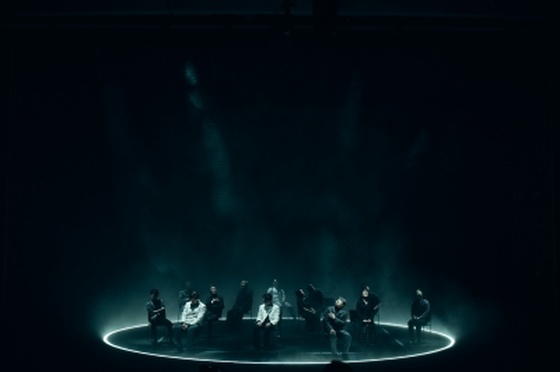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취재여록] 여전히 뒷전인 '법과 제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보증선다는 얘깁니까"
"투자자들은 어쨌든 95%를 지급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증권회사 창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재경부 관계자와 출입기자
간에 오간 대화내용이다.
과거 구호로만 그치던 개혁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장 자신있게 꺼내는 단어가 "법과
제도"다.
즉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모든 개혁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관치금융"도 아니고 따라서 개혁작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원칙과 논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11월 금융대란설"이 나돌고 채권시장이 마비상태에 놓이게 되자 정부는
지난 18일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특단의 조치들을 서둘러 내놓았다.
요지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은행을 통한 채권 직접매입
을 통해 채권가격 하락을 막을테니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자제해
달라는 것.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들을 살펴보면 "법과 제도"는 이미 뒷전으로
밀려나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비자발적 출연에 의한 채권안정기금 조성, 정부가 정해주는
은행의 회사채 매입가격, 수익증권 환매자금 지급보장 등 어느것 하나 법과
제도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
은행이 채권안정기금의 운용손실을 따질 때, 투자자들의 환매러시로 투신사
들이 95%를 지급할 수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한 대증요법의 전형이다.
물론 정운찬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시장경제 원칙은 시장이 있고 나서의
얘기다.
시장이 없어지면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국민들도
구조조정의 열매를 맛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러한 현실이 되풀이돼서는 안되겠다.
미국 UCLA대 교수인 오마에 겐이치가 "한국인은 개인적으로는 탁월한데
국가의 시스템은 세계경제에 적응력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 김병일 경제부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