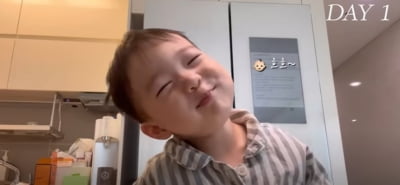[문화재 알고 봅시다] '금제여래좌상'..12판 연꽃장식 순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일신라가 정치적 문화적으로 황금기였던 8세기에 수도 경주에선 불교가
가장 융성했다.
소형으로 주조된 황금불과 금동불들이 탑에서 뿐만 아니라 신라 사찰터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불상들이 당시에 널리 보급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초기의 불상모습은 갸름한 얼굴이나 좁은 어깨, 두터운 옷자락이
양끝으로 살짝 뻗치는 등 양식 면에서 중국의 6조시대(221~581년)와 매우
흡사하다.
반면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불상은 중국 당대의 국제적 면모를 반영,
몸체는 좀더 풍만해지고 얼굴은 둥글어지며 어깨는 넓어지게 된다.
경북 경주시 구황동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이 금제여래좌상(국보 제79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도 옷주름, 받침대 등은 당나라 시대 양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다소 큰 머리와 얼굴에 가득한 미소 등이 통일신라시대 한국인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8세기 신라 불상의 조각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얼굴은 둥글며 적당히 살이 올라 있고 이목구비가 뚜렷해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불상이다.
특히 얼굴에 비해 손이나 몸이 작은 점이 눈길을 끈다.
배에는 U자 모양의 주름이 치렁치렁 윗받침까지 내려져 있고 다리엔
각각 타원형의 주름이 있다.
머리부분에는 12판 연꽃 장식을 따로 붙여 순금 재질이 주는 화려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둥근 받침대는 상.중.하를 갖춰 마치 장구를 세워놓은 모양이다.
상.하 받침은 위.아래로 향한 연꽃잎을 돌리고 중간 받침은 2단으로 겹쳐진
고리 모양이다.
한국 불상양식과 사상 및 연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재다.
높이 12.2cm, 무게 3백8g.
< 강동균 기자 kd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
가장 융성했다.
소형으로 주조된 황금불과 금동불들이 탑에서 뿐만 아니라 신라 사찰터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불상들이 당시에 널리 보급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초기의 불상모습은 갸름한 얼굴이나 좁은 어깨, 두터운 옷자락이
양끝으로 살짝 뻗치는 등 양식 면에서 중국의 6조시대(221~581년)와 매우
흡사하다.
반면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불상은 중국 당대의 국제적 면모를 반영,
몸체는 좀더 풍만해지고 얼굴은 둥글어지며 어깨는 넓어지게 된다.
경북 경주시 구황동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이 금제여래좌상(국보 제79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도 옷주름, 받침대 등은 당나라 시대 양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다소 큰 머리와 얼굴에 가득한 미소 등이 통일신라시대 한국인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8세기 신라 불상의 조각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얼굴은 둥글며 적당히 살이 올라 있고 이목구비가 뚜렷해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불상이다.
특히 얼굴에 비해 손이나 몸이 작은 점이 눈길을 끈다.
배에는 U자 모양의 주름이 치렁치렁 윗받침까지 내려져 있고 다리엔
각각 타원형의 주름이 있다.
머리부분에는 12판 연꽃 장식을 따로 붙여 순금 재질이 주는 화려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둥근 받침대는 상.중.하를 갖춰 마치 장구를 세워놓은 모양이다.
상.하 받침은 위.아래로 향한 연꽃잎을 돌리고 중간 받침은 2단으로 겹쳐진
고리 모양이다.
한국 불상양식과 사상 및 연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재다.
높이 12.2cm, 무게 3백8g.
< 강동균 기자 kd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