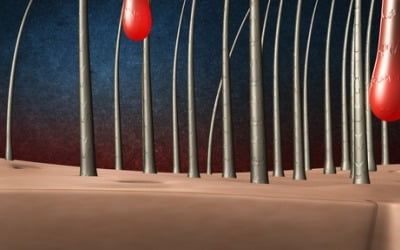수렁 깊을수록 더 목메는 '희망'..'유리구두' 펴낸 김인숙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작가 김인숙(35)씨가 세번째 소설집 "유리구두"(창작과비평사)를 펴냈다.
그의 작품들은 먼 여행지에서 온 편지같은 느낌을 준다.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올린 두레박처럼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담은
편지.
"거울의 앞뒷면 사이"에 놓인 강물이나 "빛바랜 녹색 자전거"의 몸체를
어루만지며 밤새워 쓴 편지에는 그러나 수신자가 없다.
굳이 찾는다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그"다.
이번 작품집에도 "간절함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과 "누군가에 대한 악착
같은 기다림"이 절절하게 배어 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고독하게 만드는 것일까.
단편 "풍경"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 여자가 지리산 자락의 낯선 여관에 닿아 편지를 쓴다.
"한 때는 괜찮은 적도 있었지요.
진창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것과 맞바꿀 희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렁은 달콤했지요.
진창도, 함정도 괜찮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마다 나는 보았으니까요.
저 먼 곳에 찬란히 빛날 황금다리...
그 세상을, 그 희망을...
지금도 여전히 황금다리는 존재할까?
나는 이제 스스로 수렁을 건너지 아니하고 수렁에 빠진 내 몸을 가만히
놓아둘 뿐입니다.
흘러가라고, 가다가 어느 곳에선가 멈추라고...
그런데 설마 그렇게 가다가 만나는 황금다리가 있다면, 그것은 혹여
인생의 끝은 아닌지"
여자는 자신의 상처와 함께 지난 시대의 아픔을 돌아본다.
서른 다섯인 그녀가 스무살 시절을 자주 떠올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때 겨울바닷가 여행에서 만난 중년남자의 얘기중에 "황금다리"가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함정이나 수렁인 곳을 막무가내로 들어가려는 성격이야.
그런데 그 속에 황금다리가 걸려있는 걸 누가 알겠어?"
그 시절은 황홀한 청춘이자 깊디깊은 수렁이었다.
학생운동을 하던 그녀는 이른바 "피세일"이라는 유인물 돌리기를 위해
창신동 산동네에 올라갔다가 종로5가와 동대문 사이에 대학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겁에 질렸던 80년대의 "길눈 어두운" 사람이었다.
15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주인공이 잃어버린 것들은 이뿐인가.
결혼생활의 고비를 맞아 혼자 떠난 길.
며칠을 못 버티고 결국 돌아오고 말 여행지에서 그녀는 우리가 상실해버린
수많은 것들을 비내리는 풍경속에 흥건히 담아낸다.
이러한 "그리움의 물줄기"는 "절망"과 "희망"의 양쪽 벽면을 동시에
적신다.
표제작 "유리구두"도 같은 맥락으로 다가온다.
80년대의 상처를 간직한 채 대기업 사원과 월간지 여기자가 된 대학동창생.
작가는 환멸과 분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섹스에 탐닉하는 두 남녀를 통해
잃어버린 유리구두의 꿈을 일깨운다.
양쪽 발의 크기가 다른 절름발이 여자의 슬픔은 어쩌면 또다른 황금다리로
가기 위한 통과제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작가는 개인적인 단절감과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의
거울로 비춰 보인다.
혼자 지내는 여성의 내면심리를 호수와 자전거로 연관시킨 "그 여자의
자전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한때 세상을 믿은 것처럼...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고두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
그의 작품들은 먼 여행지에서 온 편지같은 느낌을 준다.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올린 두레박처럼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담은
편지.
"거울의 앞뒷면 사이"에 놓인 강물이나 "빛바랜 녹색 자전거"의 몸체를
어루만지며 밤새워 쓴 편지에는 그러나 수신자가 없다.
굳이 찾는다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그"다.
이번 작품집에도 "간절함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과 "누군가에 대한 악착
같은 기다림"이 절절하게 배어 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고독하게 만드는 것일까.
단편 "풍경"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 여자가 지리산 자락의 낯선 여관에 닿아 편지를 쓴다.
"한 때는 괜찮은 적도 있었지요.
진창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것과 맞바꿀 희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렁은 달콤했지요.
진창도, 함정도 괜찮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마다 나는 보았으니까요.
저 먼 곳에 찬란히 빛날 황금다리...
그 세상을, 그 희망을...
지금도 여전히 황금다리는 존재할까?
나는 이제 스스로 수렁을 건너지 아니하고 수렁에 빠진 내 몸을 가만히
놓아둘 뿐입니다.
흘러가라고, 가다가 어느 곳에선가 멈추라고...
그런데 설마 그렇게 가다가 만나는 황금다리가 있다면, 그것은 혹여
인생의 끝은 아닌지"
여자는 자신의 상처와 함께 지난 시대의 아픔을 돌아본다.
서른 다섯인 그녀가 스무살 시절을 자주 떠올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때 겨울바닷가 여행에서 만난 중년남자의 얘기중에 "황금다리"가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함정이나 수렁인 곳을 막무가내로 들어가려는 성격이야.
그런데 그 속에 황금다리가 걸려있는 걸 누가 알겠어?"
그 시절은 황홀한 청춘이자 깊디깊은 수렁이었다.
학생운동을 하던 그녀는 이른바 "피세일"이라는 유인물 돌리기를 위해
창신동 산동네에 올라갔다가 종로5가와 동대문 사이에 대학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겁에 질렸던 80년대의 "길눈 어두운" 사람이었다.
15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주인공이 잃어버린 것들은 이뿐인가.
결혼생활의 고비를 맞아 혼자 떠난 길.
며칠을 못 버티고 결국 돌아오고 말 여행지에서 그녀는 우리가 상실해버린
수많은 것들을 비내리는 풍경속에 흥건히 담아낸다.
이러한 "그리움의 물줄기"는 "절망"과 "희망"의 양쪽 벽면을 동시에
적신다.
표제작 "유리구두"도 같은 맥락으로 다가온다.
80년대의 상처를 간직한 채 대기업 사원과 월간지 여기자가 된 대학동창생.
작가는 환멸과 분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섹스에 탐닉하는 두 남녀를 통해
잃어버린 유리구두의 꿈을 일깨운다.
양쪽 발의 크기가 다른 절름발이 여자의 슬픔은 어쩌면 또다른 황금다리로
가기 위한 통과제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작가는 개인적인 단절감과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의
거울로 비춰 보인다.
혼자 지내는 여성의 내면심리를 호수와 자전거로 연관시킨 "그 여자의
자전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한때 세상을 믿은 것처럼...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고두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