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내로부터 1만달러이상을 송금받은 계좌는 무려 3만6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보낸 사람은 극소수인데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이같은 불균형은
왜 발생했을까.
감사원은 12일 "국내에서 해외로 달러를 보낸 대부분의 송금자들이 당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산 송금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3억달러가 금융당국의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받은 금액이 무려 40만달러를 넘는
계좌도 26개나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돼 있는 미화 2만달러이상 송금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만달러 이상을 보낸이는 단 36명에 불과하지만 2만달러 이상 받은
계좌수는 6천8백38개에 달했다.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들도 이같은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한몫한 것으로
감사원 특감결과 밝혀졌다.
달러를 보낼때는 반드시 이를 받는 사람의 신원을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수취인의 이름을 영문으로 적었을 경우 확인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 1차적으로 외화유출을 감시해야 할 은행직원들조차 외환수수료 수입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등 외화의 불법송금을
부추기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과 은행 등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도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유중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 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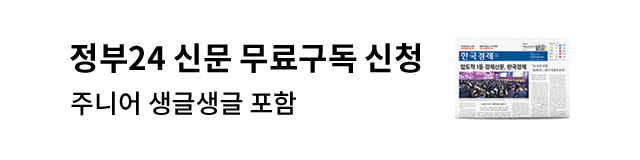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비트코인 9만9000달러 돌파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5.12608291.3.jpg)
![스프링복처럼 인생을 살것인가? [이윤학의 일의 기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3171232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