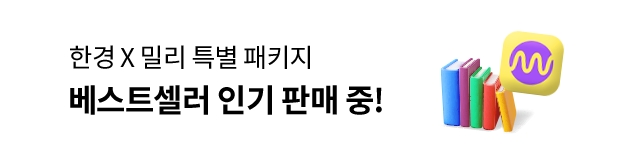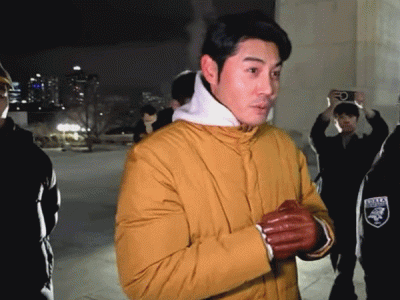"저쪽(청와대)에 한번 알아보죠"
한 기업총수가 지난해 부도직전 주거래은행장에게 협조융자를 다그치고
은행장이 쩔쩔매며 정치권 눈치를 살피는 장면이다.
협조융자과정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협조융자를 "고공플레이" "성층권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조융자는 말 그대로 단독결정이 아니다.
주거래은행과 다른 채권은행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기업과 정부부처 정치권까지 가세하기 마련이다.
한보사태는 그 결정판이다.
협조융자는 원래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채권이 발생하는게 두렵다.
기업도 속성상 부도를 피하고 싶다.
협조융자는 이런 양측의 입장이 타협한 결과다.
절차는 간결하다.
은행은 자금난을 겪는 거래업체에 대해 <>자금부족원인 <>지원시 회생여부
<>상환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다.
은행은 분석결과 회생가망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측에 자구노력 추가
담보 주식처분권위임 등을 약속받는다.
이어 채권은행장회의를 소집한다.
여기서 은행장들이 찬성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더 말려들고 싶지 않은데도 그게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주거래은행보다 담보를 적게 잡은 비주거래은행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추가대출에 참여할수밖에 없다.
각종 법령과 규정을 핑계삼아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 버틸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주거래은행측의 설득도 집요하고 스스로 기업과의 밀거래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압력도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은 은행뿐 아니라 정치권 등 이른바 "힘있는 연줄"을
찾아 "S.O.S"를 타전하기 때문이다.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연줄은 무궁무진하다.
압력도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 혈연 학연 등 온갖 연줄이 총동원된다.
정부가 개입할때는 "산업정책적 배려"같은 명분을 앞세운다는게 차이라면
차이다.
협조융자를 위한 대표자회의를 할 때 은행장들은 향후 불거질지 모르는
부실책임을 피하기 위해 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 관계자들을 배석시키기도
한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