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US 매스터즈] "퍼팅 잘해야 우승확률 높다"
말할 것도 없이 퍼팅이다.
퍼팅과 우승의 상관관계는 최근 10년간 챔피언들의 통계를 분석한 자료
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챔피언들은 드라이브거리나 페어웨이적중률 온그린율(규정타수만에 그린에
올리는 비율)등에서는 10명중 기껏 2~3명이 해당부문랭킹 10위권에 올라있다.
그러나 퍼팅부문에서는 91년의 이안 우즈넘을 제외하고 9명이 모두 10위권
에 들어 퍼팅능력이 우승과 직결됨을 보여주었다.
특히 90년의 닉 팔도와 94년의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은 당시 퍼팅랭킹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10년동안 챔피언들의 퍼팅부문 평균랭킹은 4.8위로
나타났다.
매스터즈 단독중계방송사인 미 CBS 골프해설가인 켄 벤추리는 "평범한
퍼팅실력으로는 그린재킷을 입을 생각을 아예 말라"고 말할 정도다.
그렇다면 타이거 우즈는 이들 챔피언과 비교해 볼때 어떤가.
우즈의 통계는 올해 그가 출전한 대회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우즈가 챔피언들(평균치)보다 앞선 것은 드라이브거리와 온그린율.
드라이브거리는 무려 21야드나 많이 나간다.
그 장타력을 바탕으로 온그린율도 5%포인트나 높다.
문제는 퍼팅이다.
페어웨이적중률도 우즈가 뒤떨어지지만 오거스타GC는 볼이 소나무숲이나
관목사이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페어웨이와 러프의 구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문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챔피언들은 4라운드토탈 평균 111개의 퍼팅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라운드당 27.8개인 셈.
그러나 우즈는 라운드당 평균퍼팅수가 28.6이다.
라운드당 챔피언들보다 거의 한번씩 퍼팅을 더하는 것이다.
1타가 우승을 좌지우지한다고 볼때 3.3타(4R 전체)는 엄청난 차이다.
결국 우즈가 21년만에 "메이저대회 데뷔우승"을 엮어내느냐의 여부는
장타력보다는 퍼팅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골프브리핑] 테일러메이드 골프, 한국에 골프볼 신공장 증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4068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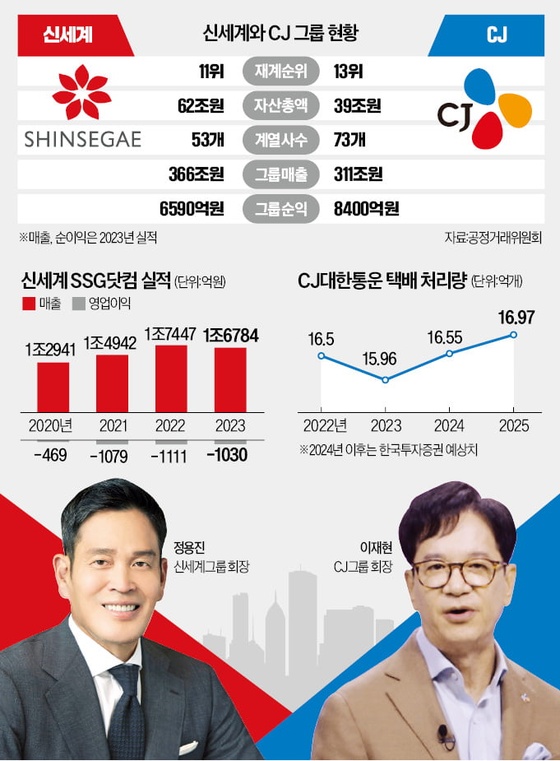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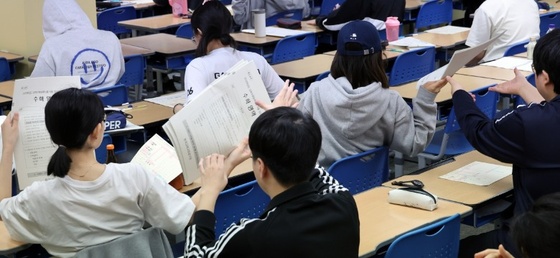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서울시향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444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