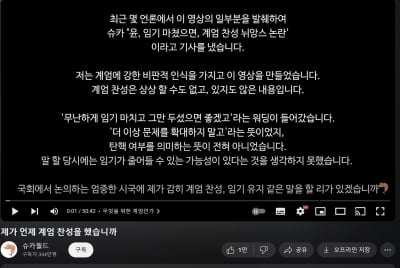[취재여록] 과학의 대중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들어 과학기술관련 국제회의가 봇물터진듯 열리고 있다.
제8회 국제 동아시아과학사회의가 지난 31일 성황리에 끝난데 이어
2일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고등과학원 개원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제 순수응용화학연합회의 분과회의도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서울이 마치 과학기술의 미래를 약속하는 도시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국제회의가 행사장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참석자들이 대부분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일반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과학기술에 관한 정부나 일반인의 관심이 그만큼 부족한 것같아
씁쓸함을 느낄수 밖에 없었다.
이는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게 틀림없다.
과학기술분야는 너무 어려워 전문가들의 몫일 뿐이라는 해묵은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과학기술의 발전여부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지를
가름짓는 잣대이다.
그래서 이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특별법제정도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GNP의 몇%를 투자하느냐가 전부는 아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지금처럼 과학기술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관심이 괴리되어서는 "일류"를 약속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로서의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일이다.
독창적 아이디어와 성과물은 창조적 소수에서 나온다지만 온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창조적 소수가 배출될리 없다.
지난 5월 과학기술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 출연연구소소장은
"GNP대비 5%를 투자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자폭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문화가 확산돼 탄탄한 토대를 이루지 않는한 21세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소리없이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과 정부의 애정어린 눈길이 시급한 때이다.
김재일 < 과학정보통신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
제8회 국제 동아시아과학사회의가 지난 31일 성황리에 끝난데 이어
2일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고등과학원 개원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제 순수응용화학연합회의 분과회의도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서울이 마치 과학기술의 미래를 약속하는 도시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국제회의가 행사장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참석자들이 대부분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일반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과학기술에 관한 정부나 일반인의 관심이 그만큼 부족한 것같아
씁쓸함을 느낄수 밖에 없었다.
이는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게 틀림없다.
과학기술분야는 너무 어려워 전문가들의 몫일 뿐이라는 해묵은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과학기술의 발전여부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지를
가름짓는 잣대이다.
그래서 이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특별법제정도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GNP의 몇%를 투자하느냐가 전부는 아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지금처럼 과학기술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관심이 괴리되어서는 "일류"를 약속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로서의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일이다.
독창적 아이디어와 성과물은 창조적 소수에서 나온다지만 온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창조적 소수가 배출될리 없다.
지난 5월 과학기술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 출연연구소소장은
"GNP대비 5%를 투자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자폭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문화가 확산돼 탄탄한 토대를 이루지 않는한 21세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소리없이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과 정부의 애정어린 눈길이 시급한 때이다.
김재일 < 과학정보통신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