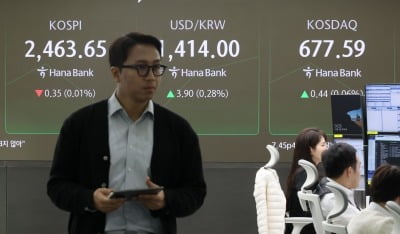"협의"해야하는 일이라면 공개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발행가산정은
증권감독원의 고유업무이다.
이는 윗사람의 눈치없이 결정을 내릴수 있기에 그만큼 증감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행가산정은 공개가 확정된 이후 가장 커다란 이권덩어리이다.
발행가가 높을수록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업이나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개기업중 한국산업리스는 발행가가 액면가(5,000원)보다 260%
많은 1만3,000원으로 결정돼 308억원의 초과발행금을 챙겼다.
발행가가 100원만 높아져도 이회사는 3억8,600만원을 챙길수 있었다.
발행가 100원 차이에 이처럼 수억원의 초과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개를 다소 늦추더라도 발행가를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발행가산정에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으로 발행가는 공개주식의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금액범위내에서 발행회사와 공개를 주간하는 증권사가 협의해 신청토록
돼있다.
본질가치란 해당기업의 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자산가치와 공개후 2년간의
추정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을 주식수로 나눠 산출하는 수익가치를 통해
구한다.
또 상대가치는 동종업종의 상장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돼있다.
공개기업이 갚지 못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을 경우에는
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행사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지 못하도록 돼있다.
언뜻보면 발행가 산정방식이 이처럼 정형화돼있는 것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함을 알수 있다.
자산가치는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감가상각이나 재평가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수익가치는 공개이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추정순이익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또 상대가치는 동종업계의 상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기업의
실적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개된 기업가운데 케이아이씨 화승전자등은 재고자산을
조작해 자산가치를 높였던 사실이 감리결과 밝혀졌다.
성지건설은 공개 첫해에 부도를 낸만큼 수익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공개후 드러난 셈이다.
보통 발행가는 상장후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되는데 지난해 공개된
기업들 가운데 국제상호신용금고(신신금고) 조일제지 동양백화점 등은
상장후 시세가 발행가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 LG정보통신 한국안전시스템(에스원) 한국합섬등은 현시세가 무척 높아
발행가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개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사 인수담당자들은 "발행가를 놓고 증권감독원
해당부서와 흥정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S증권 K차장)고 밝히고 있다.
또 대주주들이 발행가를 높이기위해 직접 증감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는 발행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고 털어놓고 있다.
증감원에서는 이와 관련, "증감원은 공개접수시 신청된 발행가격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만 평가할 뿐이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재찬 기업등록국 부국장)고 반박하고 있다.
흥정이 있다면 무작정 발행가격을 높이려는 대주주와 상장후 일정기간
관리를 맡아야하는 주간증권사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의해 발행가격이 산정되지 않는 현재의 증시 구조하
에서 증권감독원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렵다는게 대부분 증권관계자들의
견해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



![[마켓PRO] 수익률 상위 1% "삼성전자 집중매집, SK하이닉스는 덜어낼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71219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