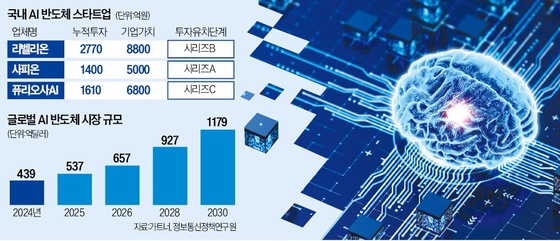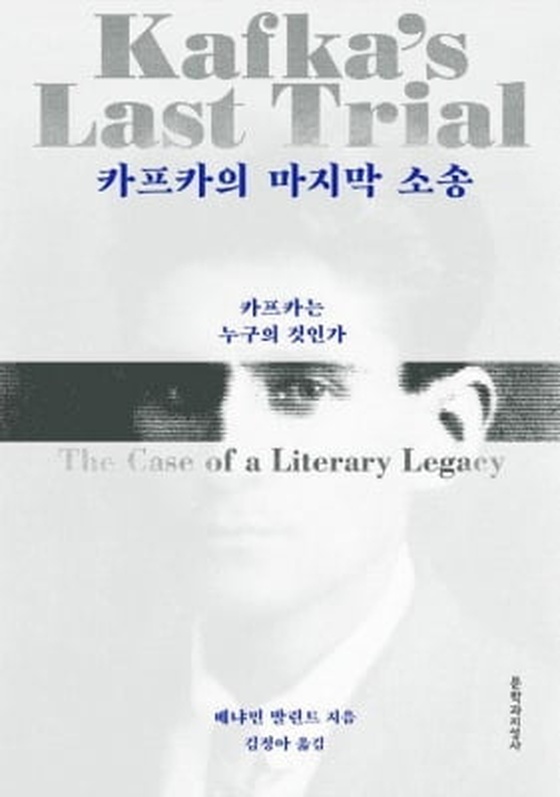소반속에 담긴 조형미 .. 장방형 통영반/다각형 나주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없어서는 안될 살림살이인 소반.
최근 출간된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학고재간)는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소반의 종류와 아름다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일본인으로 우리나라 공예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아사카와 다쿠미
(1891~1931)가 1929년 처음 펴낸 이 책은 용도와 제작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소반의 재료와 모양, 제작과정, 특징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반은 지역에 따라 형태와 구조에 차이가 많다.
지방의 특색이 두드러진 소반은 경남 통영산, 전남 나주산, 황해도
해주산등.
따라서 경상도에는 통영반, 전라.충청도에는 나주반, 서부지방과
강원도에는 해주반이 주를 이룬다.
통영반은 반이 가장자리를 남기고 파낸 한 장의 판으로 되어 있다.
다리는 촉으로 고정시키고 네 변에 상하 두 단의 중대를 둘렀다.
윗중대와 반 사이에 문양을 넣은 판을 끼워넣었다.
나주반은 반의 가장자리가 대부분 접합되어 있다.
반 아래 운각이라 불리는 완만한 곡선테두리가 있다.
다리는 반에 직접 붙이고 운각이 다리 상부에 끼워져 있다.
네 변을 두르는 중대는 없거나 다리 중간위에 한가닥만 둘러져 있다.
전체가 판으로 만들어진 해주반은 반을 통영반같이 파냈다.
반 아래 좌우 양면 끝에 투조된 판을 책상다리처럼 붙이고 전후 양면을
운각으로 장식했다.
이상 세가지외에 가장 흔한 형태는 개다리소반.
부드럽게 굽어 밑이 안쪽을 향한 네 다리가 반을 지탱한다.
다리와 반의 접합부분이 두껍고 문양이 거의 없어 튼튼하게 보인다.
통영반 해주반은 대체로 장방형이고, 나주반 개다리소반은 다각형 또는
원형이 많다.
다각형은 십이각이 보통이나 팔각인 것도 있다.
크기는 반면의 지름이 45.5cm내외, 높이 24.2~30.3cm인 것이 많다.
주상은 그 절반 정도.
재료로는 폭이 넓고 뒤틀림이 적은 은행.느티.참피.오리나무등이 많이
쓰인다.
은행나무상은 행자상, 느티나무상은 귀목반이라 불린다.
다리는 소나무와 느티.오리.단풍.물푸레 나무등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운각은 톱자국을 넣어 구부릴 때 부러지지 않는 버드나무와 백양나무가
사용된다.
< 송태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금리인하 '연내 1회' 축소에도…S&P·나스닥 또 최고치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7767.1.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