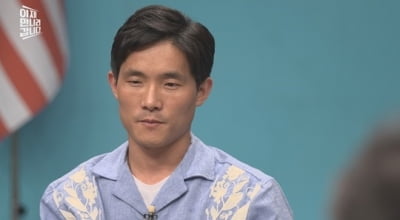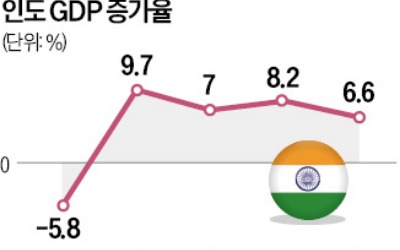리콜"은 국내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감한 시도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예방 진단 차원의 집합적인 애프터서비스를 본격 실시함으로써 "한번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신을 구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국내 기업들은 지금까지 팔려나간 차량에 일부 부품결함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안별로 "비공개 시정조치"를 취했을 뿐 공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개 리콜을 한다는 건 보기에 따라서 기업 스스로의 "불실"을 자인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측도 이번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이 대목을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한다.
"내수시장 고객의 리콜 캠페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경쟁사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현대자동차 발표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대가 공개 리콜을 "밀어붙이기로" 최종 결심한데는 몇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대상 차종인 포터 그레이스 갤로퍼 등 3개 모델(94년 10월12일~95년
3월21일 출고분)에서 진공펌프등 일부 부품의 불량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클레임이 제기되는 차량에 대해 "신고베이스"로만 건건이
수리를 하는 건 오히려 회사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따라서 "예방 정비"라는 국내에서는 흔치않은 시스템을 앞서
도입함으로써 "고객 우선주의"라는 기업 이미지를 과시하자는 계산도
깔고있는 것 같다.
현대에 앞서 몇해전 기아자동차가 일부 차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엔 "비공개"선에서 그쳤다는 걸 보면 현대로서는 일종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대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국내 자동차소유자들이 겪어온 "애프터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도 관심
사항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수입선다변화 조치등 "혜택"을 향유하며
사후서비스엔 다소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점증하는 대한자동차시장 개방압력 등으로 국내자동차시장
도 "완전 경쟁"에 돌입할 날이 멀지않았다.
따라서 업체들로서는 "능동적인 고객 끌어안기"와 품질제고 등에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측면도 있다.
[[ 리콜제도란 ]]
출고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생산업체가 해당 모델 전량을
회수해 점검.수리.보상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사전 형식승인제도가 없이 업체 스스로의 자체 시험에 의한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나 요즘은 대부분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서 내용 결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 36조와 시행규칙 57조)리콜을 의무 시행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20개 메이커가 123회에 걸쳐 657만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이중 한국산 자동차도 6개차종 37만9,000여대가 다섯차례에 걸쳐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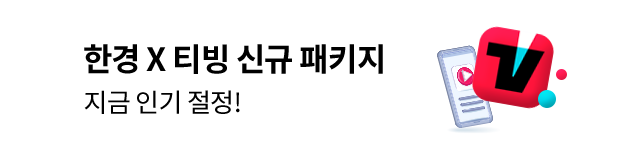
![정규 방송 중단하고 긴급 보도…'尹 사과' 의도 파악에 분주한 외신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B.3886892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