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현장 리포트] 연극 '새들은 제이름을 부르며 운다'
우리의 미래가 공명정대한 평등의 땅이 되리라 믿었어. 하지만 이토록
더디고 불확실할줄은 몰랐어. 이제와 생각해보면 내 과오는 너무 먼곳을
보고 큰것을 탐내며 살았다는거야"
신경안정제를 삼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민화의 유서는 80년대를
사회개혁이라는 열병을 앓으며 지냈던 젊음의 항변이다.
9월29일까지 대학로 강강술래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새들은 제이름을
부르며 운다"는 80년대를 고뇌의 시대로 지낼수밖에 없었던 다섯명
젊은이들의 이야기.
대학시절 운동권의 핵심멤버로 활동하다 공장에 위장취업하나 시대에 대한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민화, 태백 탄광촌에서 일하며 그림을
그리는 형조, 뚜렷한 주관없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은혜,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운형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여자 섭렵으로
달래는 시현.
"새들은..."은 80년대를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으로 먹고 살던 사회
참여자들이 공장이나 탄광에 뛰어드는 현장운동의 유효성이 상실돼가면서
치루게되는 아픔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진실에 대한 치열성과 열정이 소진되면서 겪는 젊음의 방황과 혼란 그리고
어긋나기만 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잔잔하게 펼쳐진다.
그러나 80년대를 이야기하는 작품들 대부분이 그렇듯 이 연극 역시 해결책
없이 "그때 우리의 젊음은 그랬었지"하는 내용으로 끝난다.
"일상의 삶을 가꾸고 거기에 집착하면 더 큰것을 잃을것 같아" 결혼이나
생활의 안정같은 개인의 사생활은 돌보지 않았던 젊음이중 몇몇은 어설프게
사회에 적응하고 어떤이는 허망한 마음에 인도로 떠나고 어떤이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공연은 막을 내린다.
간단하게 처리한 무대장치와 땀에 젖은 배우들의 열성적인 몸짓이 인상
깊은 무대였다.
또 진지하고 무거운 내용임에도 객석은 관객들로 가득 찼고 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들이 간간히 눈에 띄어 더욱 반가운 자리였다.
공연은 4시30분 7시30분 하루에 두번이고 월요일은 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게임음악 선입견 바꾸는 RPG 콘서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52592.3.jpg)

![[이 아침의 발레리노] 중력을 거스른 몸짓…발레를 해방시키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5313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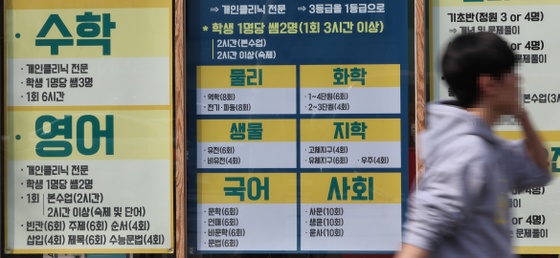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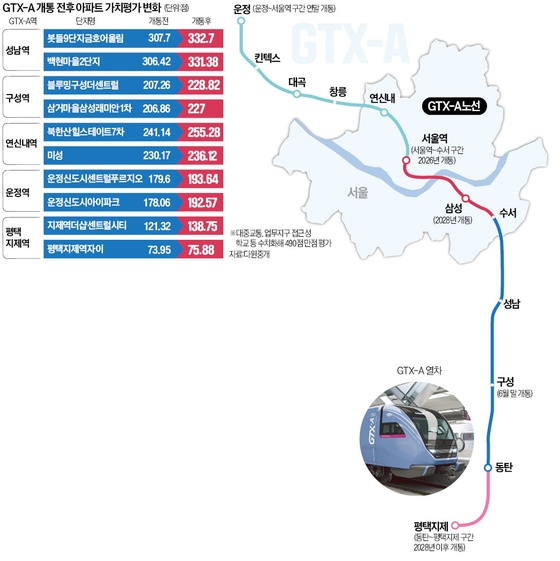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게임음악 선입견 바꾸는 RPG 콘서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259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