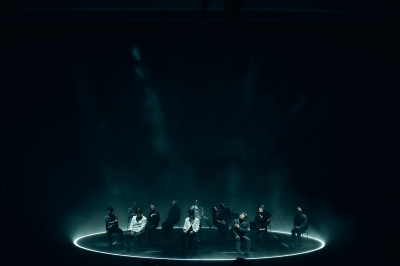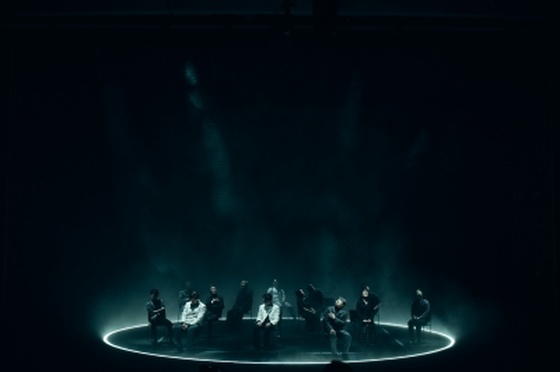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오늘의 출판가] 한국미의 진수 '최순우 추모선집' 발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혜곡 최순우선생(1916~1984)의 글을 모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학고재간)가 출간됐다.
지난 92년 혜곡의 저서와 논문 신문잡지기고문 미발표원고 대담내용 등
모든 저작을 수집, 정리해 "최순우전집"(전5권)을 간행한바 있는 도서
출판 학고재가 고인의 10주기를 맞아 전집내용중 한국미의 특성을 잘
나타낸 글만을 뽑아 새로 펴낸 선집이다.
회화와 도자기에서 건축 불상 석탑 민속공예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유산
전반의 명품에 대해 쉽고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해설한 글을 한곳에
모았다.
불국사의 대석단,부석사 무량수전,통도사,속리산 법주사 팔상전,비원의
연경단등 건축분야 13편 고구려 금동여래입상,백제 석조여래좌상등 불상
분야 12편,청자돋을무늬연당대접 등 청자분야 13편,백자상감초문편병등
백자분야 16편등 총1백37편의 글은 우리 문화유산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미의 본질을 전하고 있다.
이번 선집에는 또 매편마다 관련사진을 곁들여 읽는이의 이해를 도왔다.
고려청자에 대한 혜곡의 해설은 청자미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밝힌 글로
후학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고려 사람들이 중국 청자의 비색과 분별하기 위해 스스로 이름지어 비색
이라고 자랑삼아 불러온 이 고려청자의 푸른 빛깔은 해맑고도 담담해서
깊고 조용한 맛이 오히려 화사스러움을 가누어 준다고도 할 수 있으며
고려청자의 자랑은 이 비색의 깊고 은은함과 길고 기품있는 곡선의
아름다움이 멋진 조화를 이룬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순우는 필명이고 본명은 희순이다. 개성 태생인 그는 송도고등보통학교
를 졸업한후 당시 개성박물관장이었던 우현 고유섭선생의 권유로 45년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간 이후 작고할때까지 반세기를 박물관과 더불어
지냈다.
학예관 미술과장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74년 박물관장이 된 이후 84년12월
69세를 일기로 타계할때까지 만10년간 관장직을 맡았다.
50년대부터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 이화여대등에서 미술사 강의를 했고
67년이후 문화재위원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대표 한국미술사학회 대표등을
역임했다.
그가 6.25와 1.4후퇴 당시 전화를 피해 덕수궁박물관의 유물을 부산으로
피난시키고 피난 박물관을 지킨 일은 유명하다.
혜곡은 관리위주의 박물관을 연구하는 박물관으로 개편, 학예연구직의
위치를 정립했고 자신도 많은 연구논문과 저서를 냈다.
"고려청자 연구""한국회화"등은 그의 대표작이다. 또한 한국미의 탐구
에도 힘써 80년에는 "한국의 미-한국의 마음"을 내놓기도 했다.
정양모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 책의 서문을 통해 "최순우 선생은 군더더기
없는 간결하고 단순하면서 소산한 아름다움과 담백한 맛을 사랑한 참멋에
사신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정관장은 또 "혜곡은 한국미에 대한 난해한 철학적 의미를 지닌 글이나
학문적 업적을 쌓기위한 논저보다는 이슬보다 영롱하고 산바람보다 신선한
글로 우리들 가슴을 언제나 한국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한 분이었다"고
한국미에 대한 그의 혜안을 기렸다.
<정규용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냄새도 연기도 없다" 입소문…없어서 못 파는 '신종 담배'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46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