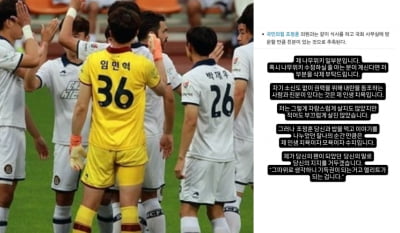[UR] 'UR, SR될 뻔'..당초 서울서 협상예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루과이라운드(UR)는 원래 서울라운드(SR)가 될뻔했었다" 세계교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신다자간협상이 당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야기는 10여년전인 1983년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내에선
수입개방을 놓고 부처간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경제기획원과
김재익경제수석등은 외국의 압력뿐아니라 우리 내부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도
과감한 수입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상공부 농림수산부등
실무부처에선 수입개방추진에 난색을 표명하던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83년 경제기획원에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기획단이 설치되고
개방파였던 김기환당시상공차관이 단장으로 부임하면서 대세는 개방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줄곧 아시아신흥공업국(NICs)
대표격으로 참여했으며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섰다. 마침내 85년 스톡홀름 통상장관회의에선 다음 통상회담을 서울에서
열고 신다자간협상의 출범을 선언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때 경쟁국
으로는 캐나다 벨기에 싱가포르등이 나섰으나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줌
으로써 서울라운드의 출범이 가시화됐던 것이다.
그러나 85년에 들어서면서 정부내 분위기는 1백80도 바뀌게 된다. 당시
노신영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정부내 주도권은 개방파에서 다시
반대파쪽으로 넘어가고 개방파의 본산인 대외협력위 기획단은 해체돼
대외경제조정실로 축소개편됐다.
결국 86년2월 전대통령은 서울라운드의 개최를 번복하고 만다. 표면적
이유는 아시안게임과 겹친다는 설명이었으나 실제는 노총리가 앞장서서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노총리는 우리정부가 나서서
광범위한 교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신다자간협상을 벌이는 것은 국민여론에
거슬릴수 있다며 대통령의 결심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런 곡절을 거쳐
서울라운드는 무산되고 대타로 우루과이가 선정돼 신다자간협상이 이곳에서
열리게 됐다.
만약 이때 우리정부의 입장만 바뀌지 않았다면 세계경제변혁의 진원지가
서울이 될뻔했었다는 얘기다.
<차병석기자>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신다자간협상이 당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야기는 10여년전인 1983년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내에선
수입개방을 놓고 부처간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경제기획원과
김재익경제수석등은 외국의 압력뿐아니라 우리 내부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도
과감한 수입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상공부 농림수산부등
실무부처에선 수입개방추진에 난색을 표명하던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83년 경제기획원에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기획단이 설치되고
개방파였던 김기환당시상공차관이 단장으로 부임하면서 대세는 개방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줄곧 아시아신흥공업국(NICs)
대표격으로 참여했으며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섰다. 마침내 85년 스톡홀름 통상장관회의에선 다음 통상회담을 서울에서
열고 신다자간협상의 출범을 선언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때 경쟁국
으로는 캐나다 벨기에 싱가포르등이 나섰으나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줌
으로써 서울라운드의 출범이 가시화됐던 것이다.
그러나 85년에 들어서면서 정부내 분위기는 1백80도 바뀌게 된다. 당시
노신영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정부내 주도권은 개방파에서 다시
반대파쪽으로 넘어가고 개방파의 본산인 대외협력위 기획단은 해체돼
대외경제조정실로 축소개편됐다.
결국 86년2월 전대통령은 서울라운드의 개최를 번복하고 만다. 표면적
이유는 아시안게임과 겹친다는 설명이었으나 실제는 노총리가 앞장서서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노총리는 우리정부가 나서서
광범위한 교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신다자간협상을 벌이는 것은 국민여론에
거슬릴수 있다며 대통령의 결심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런 곡절을 거쳐
서울라운드는 무산되고 대타로 우루과이가 선정돼 신다자간협상이 이곳에서
열리게 됐다.
만약 이때 우리정부의 입장만 바뀌지 않았다면 세계경제변혁의 진원지가
서울이 될뻔했었다는 얘기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