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큰 음악회 .. 이강숙 예술종합학교장
없었다. 피아노라는 악기도 없었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4천여종의
음계중의 하나라고하는 장음계에 바탕을둔,우리가 지금 즐겨부르는 서양식
노래도 없었다.
수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민족사적 차원에서 보면 백년은 참으로
짧은 세월이다. 그런데 수천년 동안 우리의 가슴속을 파고 들었던 "과거의
악기"는 대중적 취향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지금은 피아노가 악기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음악은 진공에서 태어나는것이 아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순수한
음악이라고 해도 음악은 지저분한 경제 사회 문화적 기후안에서 숨쉬면서
살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창작풍토는 그동안 어떤 경로를 밟아 왔던가. 홍난파는
제1세대의 작곡가다. 18,19세기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던 "음악재료"를
사용한 홍난파는 우리노래말에 서양식 곡을 붙인 작곡가다.
세월이 흐른뒤 제2세대의 작곡가군들이 나타났다. 홍난파와는 달리
제2세대는 20세기의 서양음악 어법에 작곡의 근거를 두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근년에 와서 제3세대의 작곡가군이
등장했다. 지난 5월25일 이 제3세대 작곡가군의 대표주자인,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인식을 하고 있는 이건용이
단독으로 작곡 발표회를 가졌다. 작품도 좋았지만 음악사적 의미에서 뜻이
깊은 날이었다. 이세상 사람 모두가 이음악회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작은 음악회가 아닌 아주 "큰음악회"였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스페이스X 화성우주선 '스타십', 4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 발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22579247.3.jpg)
![ECB, 2019년 이후 첫 0.25%P 금리인하…美 Fed도 낮출까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5653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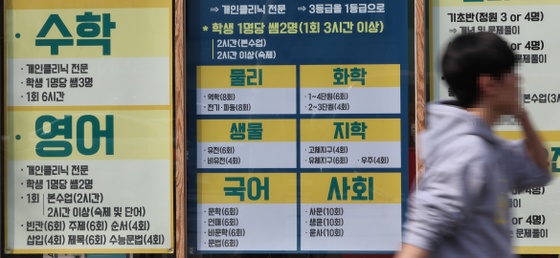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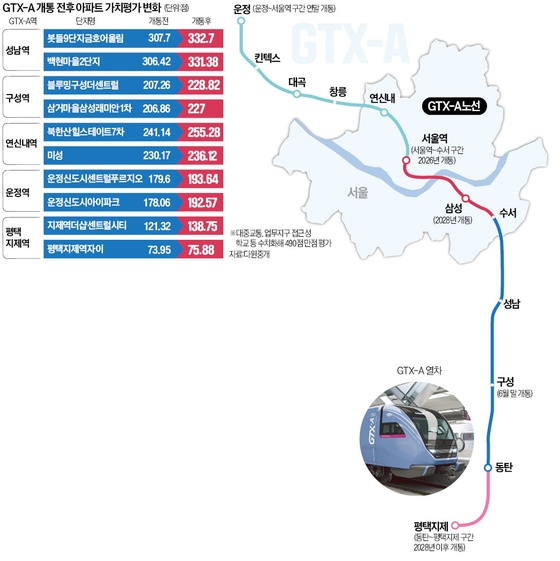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이 아침의 발레리노] 중력을 거스른 몸짓…발레를 해방시키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31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