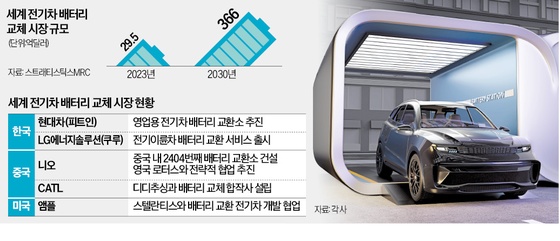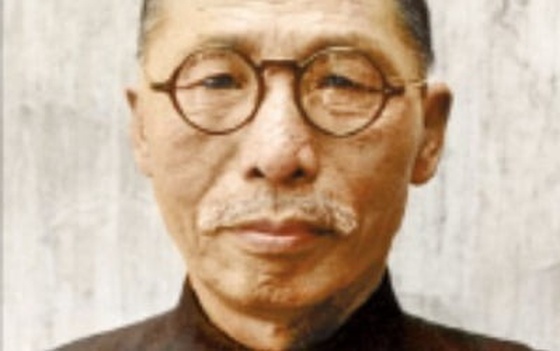물량위주 고성장전략 생산성향상 뒤떨어져 ... 산은 분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산에 투입된 요소의 생산성향상보다는 요소투입량증대등 양적인
투자전략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은행은 11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추이와 변동요인"이란 보고서에서
지난 71년부터 91년까지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연평균 0.98%에 그쳐
생산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7.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 노동등 생산에 투입된 모든 요소의 변화에 따른
산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동 자본생산성등 단일요소생산성이 생산성지표로 주로
사용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기간중 연평균 총요소생산성증가율 0.98%는 61 82년중
일본의 연평균증가율 6.41%에 크게 못미치고있다.
또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국내총생산증가율로 나눈
생산증대기여도(7.24%)도 일본의 50%에 현저히 뒤지고있다.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증감추이를 기간별로보면 81 85년은 연평균
5%증가를 보여 증가세가 가장 높았다.
86 90년과 71 75년은 각각 연평균 1.31%와 1.2%증가에 그쳤다.
반면 76 80년에는 노동투입의 급증에따른 자본 장비율하락과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다투자등으로 연평균 3.74%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85%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연평균 4.48%증가한 1차금속이 증가세가 가장 컸으며 음식료품
담배업종은 오히려 연평균 0.86%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제조업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질적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방안으로?기술개발투자확대?노동과 자본등
투입요소의 질적개선?근로의욕고취와 경영합리화등을 꼽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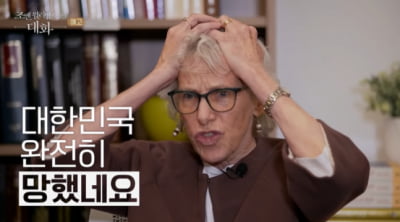
![프롭테크업계 "AI기술 접목하려면 특화된 데이터 확보해야" [Geeks' Briefing]](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2757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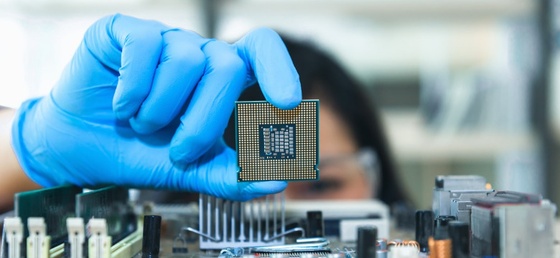
![금리인하 '연내 1회' 축소에도…S&P·나스닥 또 최고치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7767.1.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