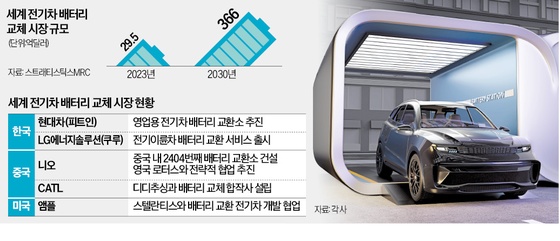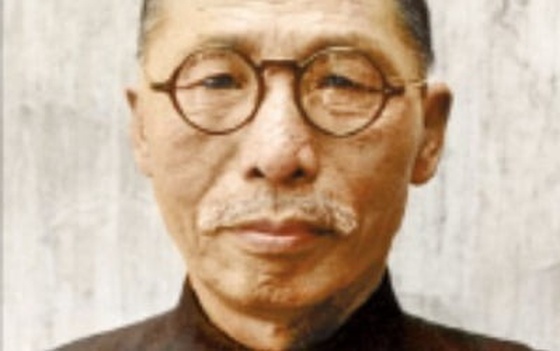[책마을] 中·대만 3통시대 시작은 '모스크바 인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명호 지음 / 한길사 / 452쪽 / 1만8000원

그가 중국을 이야기할 때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2012년에 나온《중국인 이야기 1, 2》도 그랬고 이번에 나온《중국인 이야기 3》도 마찬가지다.
![[책마을] 中·대만 3통시대 시작은 '모스크바 인연'](https://img.hankyung.com/photo/201405/AA.8629518.1.jpg)
마오쩌둥 사망 뒤 혁명 원수들은 손을 잡고 4인방(왕훙원·장춘차오·장칭·야오원위안)을 몰락시킨다. 그 다음에 부상하는 사람은 문화혁명 후 좌천당했던 덩샤오핑이다. 마오 사망 후 권력 투쟁을 설명하는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긴박하다. 중국 공산당을 만든 천두슈, 대륙과 대만에서 모두 추앙받는 위인 위유런, 군벌 위안스카이와 섭정왕 짜이펑 등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이야기에 흠뻑 빠지게 된다. 흥미로운 글 외에 접하기 어려운 사진들을 보는 재미까지 겸비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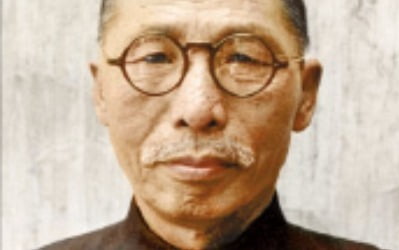
![[이 아침의 배우] '철의 여인' 메릴 스트리프, 할리우드 유리천장 깨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2501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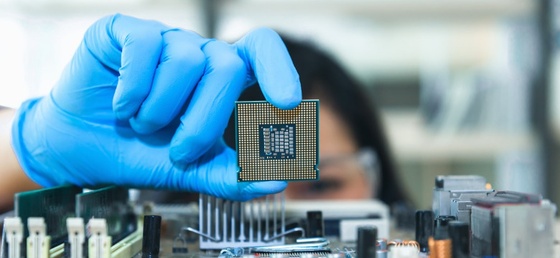
![금리인하 '연내 1회' 축소에도…S&P·나스닥 또 최고치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7767.1.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