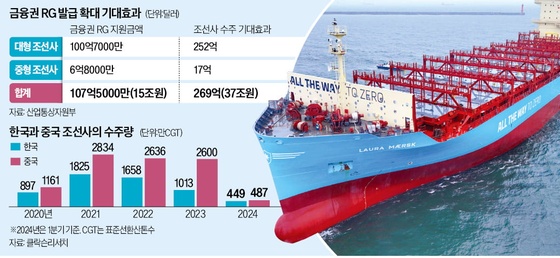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정규재 칼럼] 미래부 논란, 리펜슈탈의 추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방송 대부분이 좌편향 심각
길게 끌면 나치 괴벨스가 웃을 판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방송은 영상 매체다. 활자 매체인 신문과는 대중 파급력의 차원이 다르다. 다우너 소는 지금도 광우병 소인 것처럼 대중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영상의 힘이다. 정치 선동이 방송을 올라 타는 경우라면 최고의 효과음이 울려 퍼진다. 히틀러의 선전대를 조직했던 괴벨스의 대중조작 이론은 방송에 집중한 것이지 결코 신문에 주목한 이론이 아니다. 당시는 아직은 라디오가 대세였던 시기다. 아니 라디오조차 초창기였다. 영상을 통한 대중조작은 레니 리펜슈탈의 발명품이다. 그는 히틀러의 요청으로 1935년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 장면을 영상에 담아냈다. 거대한 집회 광장에 모여든 청중들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똑같은 각도로 손을 들어 경례하는 그 유명한 흑백화면이 그의 작품이다. 그 작품의 이름은 ‘의지의 승리’다. 그 미학적 순수성에, 대중 광기의 폭발에, 열정의 결집에 독일인들은 나치당원이 되어갔다. 무릎에서 올려다보는 각도로 찍는 촬영기법으로 히틀러를 영웅적 이미지로 그려낸 사진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1935년 베를린 올림픽을 영상기록으로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고전시대의 영웅 신화가 현실로 부활한 듯한 황홀감을 시청자들에게 안겼다.
“끊임없이 반복하면 네모가 원이라고 믿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는 괴벨스의 궤변을 이 잡지는 옮겨 싣고 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괴벨스를 혹독하게 공부했다”고 선언한 국민TV다. 실로 포스트모던적이다.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이미 10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모았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우파단체인 시대정신도 요즘 인터넷방송국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방송국 이름은 ‘이런-E-RUN-TV’다.
방통 논쟁이 복잡해진 데는 종편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잡담 수준이다. 민주당이 종편을 걸고 넘어지는 듯한 이미지를 풍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광우병 대중선동의 추억에 집착한다는 느낌만 줄 뿐이다. 보도는 방통위, 산업은 미래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이 오히려 이론적이며 현실적이다. 철도조차 레일(하부)과 운행(상부)을 분리하는 추세다. 전력도 발전과 판매를 분리하고 있다. 방송은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보도와 산업은 별개 영역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런 현실을 고의로 뒤섞어 놓고 있다. 박근혜 새 정부의 순항을 방해해보자는 딴죽걸기의 구차한 논리다. 그러나 이미 한계를 넘었다. 민주당의 절제가 요망된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