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테이블이 즐거운 음식의 비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지영 지음 / 21세기북스 / 276쪽 / 1만5000원
초콜릿에 얽힌 이야기는 데카메론을 연상케 한다. 초콜릿의 인기가 높아지던 17세기 후반 한 후작부인이 피부가 검은 아이를 낳았다. 사람들은 그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후작부인에게 매일 초콜릿 음료를 가져다주던 하인이 잘생긴 흑인이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미식가의 도서관》은 음식평론가이자 와인 강사인 작가의 통섭적인 지식이 빛나는 책이다. 음식 속에 숨어 있는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감칠맛 나게 풀어준다. 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음식문화가 가진 특징까지 깊이 있는 시선으로 건져 올렸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며 세계로 쌀국수를 퍼뜨린 베트남이나 버려질 뻔한 자투리 치즈로 ‘퐁뒤’라는 명물을 만든 스위스, 메모하는 습관이 낳은 세계적인 셰프들의 고향 프랑스의 음식문화 이야기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다.
최병일 기자 skycb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여기는 바젤] 그림보다 굿즈? 54년 만에 첫 '아트숍'](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06552.3.jpg)



![논란의 560억 달러 결국 받는다…"자율주행 전환 큰 진전"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4072306907.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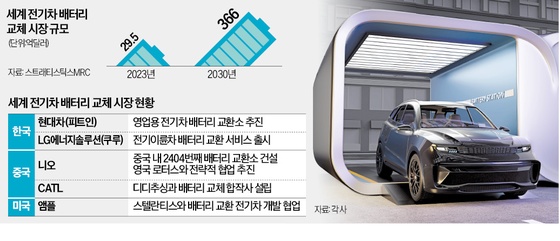





![[신간] 사소한 것들의 인문학·변화에 능숙한 삶](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70322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