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교통 불편한 방갈로르, 어떻게 인도 '실리콘 밸리'로 부상했나
이곳은 변변한 국제공항도 없는 내륙 도시로 뭔가를 수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없었다. 지리적 제한은 이 도시가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수출에 집중하게 했다. 풍부한 인력을 이용해 첨단 기술 아웃소싱 작업도 수주했다. 그리고 이곳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부유한 도시 중의 하나가 됐다.
《위닝》은 정체된 조직이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을 세계의 성공사례에서 찾고 있다. 경제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저자 해미시 맥레이는 5개 조직, 10개 도시, 5개 국가의 성공스토리를 분석한다. 하버드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부터 뭄바이의 빈민가까지 다양하다.
저자는 “성공한 조직은 구성원들이 깊은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사명감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수십 년에 걸친 풍토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대 문화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예로 든다. 에든버러 시당국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거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다. 시장을 억압할 수 있는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치중했다. 완전히 개방된 문화예술 시장을 만들자 연기자 지망생들부터 세계적 공연전문가까지 모여들었다.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 비결도 눈에 띈다.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비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분야 수출로 성공을 거뒀다. 저자는 대부분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가족이 기업의 미래를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 철저한 사후 지원이 독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 주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이 밖에 보행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코펜하겐, 효과적인 마약 중독자 재활사업을 벌이는 취리히, 이동통신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아프리카 등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직의 특장점을 부각시키며 성공한 사례들이다.
저자는 “이기는 조직은 시장에 아주 민감했다”고 말한다. 상하이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그 계획을 신속하게 바꾸면서 성장했다. 홍콩 역시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이동했다.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의 일부로 지위가 바뀔 때 재빨리 적응하면서 일어났다.
아일랜드는 금융 정책을 변경하는 조치를 빠르게 내놓아 비교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런 사례들이 시장 개척을 못하는 기업이나 뒤늦게 테마산업의 유행을 좇는 지방도시들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이 아침의 발레리노] 중력을 거스른 몸짓…발레를 해방시키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53132.3.jpg)

![카라얀, 번스타인도 찾은 '프라하의 봄'…전 세계 클래식 팬들 몰려들었다 [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5497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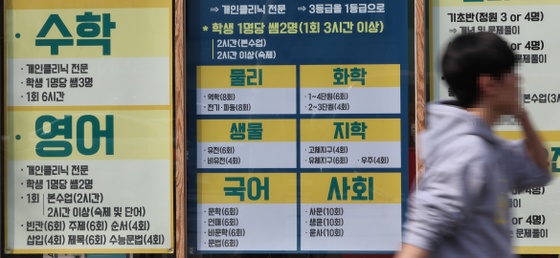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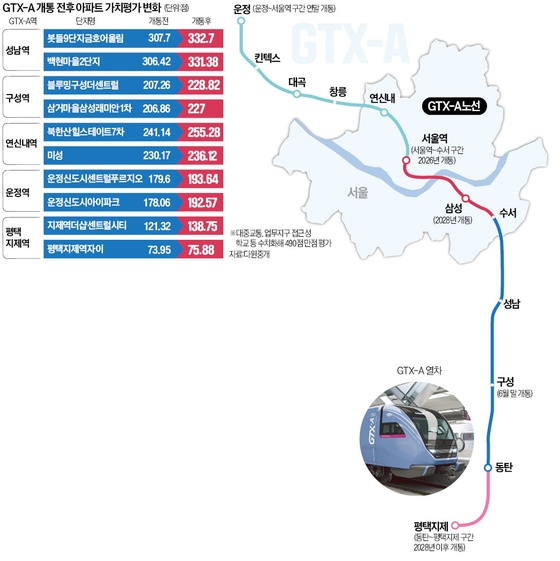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이 아침의 발레리노] 중력을 거스른 몸짓…발레를 해방시키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31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