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종교인들은 세금부터 내고 발언하시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 걷어라
정규재 논설실장 jkj@hankyung.com
![[정규재 칼럼] 종교인들은 세금부터 내고 발언하시라](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1121210251&indate=20110627&photoid=201007058425&size=1)
이탈리아가 종교세를 새로 걷을 모양이다. 호텔 등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에 면세 혜택까지 줄 수는 없다는 주장은 위기 이전부터도 제기돼 왔던 터다. 종교재단이 영리사업을 통해 올리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고 보유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통해 수억달러의 세수를 더 걷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고 정치적 발언권의 출처다. 민주주의 자체가 납세에 대한 반대급부에서 시작됐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투표권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치인이 된 사람도 많다. 한국의 종교인들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세속의 정치에 대해서는 유달리 목소리가 크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승려와 목사 신부들의 과도한 정치 발언은 이미 세속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고 할 정도다.
성경에는 카이자르의 것은 카이자르에게 주라고 명시돼 있지만 기독교인부터가 세금 내기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천주교 신부들이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을 뿐이다. 전국에 예배당과 사찰, 성당이 9만300개다. 성직자는 2008년 기준으로 36만5000명이다. 교단 입장에서는 수익사업 아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없다는 것이지만 영리와 공익 사이에는 회색지대도 많다. 교단의 회계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종교인의 개인 소득세는 전혀 다른 문제다. 세법에는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좋다는 면세 조항이 전혀 없다. 그동안 국세청이 걷지 않았을 뿐이다. 천주교 신부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터에 종교인 비과세가 관습법의 지위를 얻을 수도 없다. 결국 국세청의 직무유기였던 것이다.
연말정산 시기가 또 다가왔다. 세금을 덜 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신자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인구의 53%가 신자다. 교단들의 주장을 합치면 신자 수는 8300만명으로 불어난다. 문제는 상당수 신자들이 내지도 않은 헌금을 냈다고 하거나 금액을 크게 부풀린 종교 기부금 증명서를 제출하고 종교단체들은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돌려받는 세금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돈은 부처님이나 하느님에게 내고 세금 감면은 지상에서 받는다면 그 분들의 입장도 매우 곤란하실 테다. 신자들이 비신자의 세금을 떼먹는다면 염치없는 일이다.
목소리 큰 종교 지도자 중에 자진해서 소득세 내자는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서글프다. 누군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욕설을 듣기 일쑤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서야 비로소 발언권도 생긴다. 종교 재단을 더이상 지하경제의 어두운 영역에 방치하고 있을 수도 없다. 교회나 사찰을 매매하거나 상속하면 양도세나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다. 대부분 OECD 국가들도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도 신부들에게 개인소득세는 꼬박꼬박 물려왔다.
세계가 복지재원 조달에 난리다. 부가세 인상은 기본이고 부자증세 국가도 많다. 우리 정부도 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나설 차례다. 모 승려의 말을 되돌려 주자면 종교인 과세 주장은 이번에도 ‘쥐 귀에 경 읽기’로 그칠 것인가.
정규재 논설실장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원가 8만원' 디올의 뒤통수…"모조리 불매" 터질 게 터졌다 [안혜원의 명품의세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60987.3.jpg)

!["예약 꽉 찼어요" 인기…강남서 반응 폭발한 투어의 정체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5707.3.jpg)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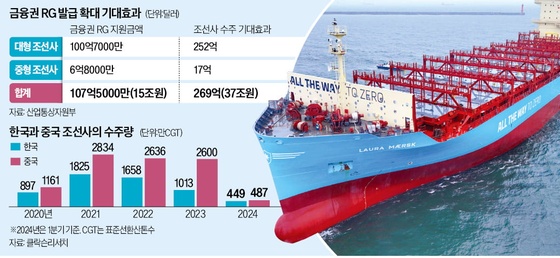





![[게시판] 금감원, '1사 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706592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