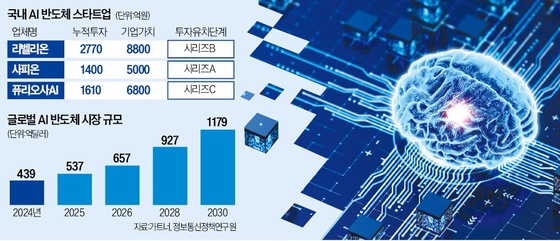[책마을] 명문大·일류직장?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관계' 부터 맺어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데이비드 브룩스 지음
이경식 옮김
흐름출판
568쪽 │ 2만5000원
네트워크가 사람을 창조
인간관계 그물망 촘촘해야 의미있고 행복한 삶 이끌어
![[책마을] 명문大·일류직장?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관계' 부터 맺어라](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1120840801&indate=&photoid=201112080177&size=1)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 물음에 답했다. 10년 만에 내놓은 책 《소셜 애니멀》을 통해서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2000년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을 결합한 ‘보보스’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지적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그는 무엇이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움직여,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한다. 시선이 독특하다. 내면의식 즉 감정 직관 편견 등 ‘무의식 영역’이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IQ와 재산, 스펙 등을 잣대로 성공을 설명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다. 내면의식이야말로 성격이 형성되고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자라나는 공간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무의식의 영역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원시적 영역, 성적충동을 억압하는 어두컴컴한 동굴”이 아니라 “정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인상적인 사고 과정이 전개되는 장소이며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현재 인간이 누리고 있는 번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며 의식보다 한 차원 아래에 있는 것, 즉 무의식적 사고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책마을] 명문大·일류직장?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관계' 부터 맺어라](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1120840801&indate=&photoid=201112080179&size=1)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주인공 해럴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면서 ‘라이벌 가설’을 거론한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함으로써 이해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는 가설이다. 사람의 뇌에 있는 뉴런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인 패턴을 자동으로 재연한다는 이론인 ‘거울 뉴런 이론’도 제시한다.
해럴드가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설명하면서는 “사람이 성장한 뒤에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단언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조상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이런 관계가 사람을 창조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의식적인 자아가 존재하기 이전에 사랑은 시작된다’는 영국시인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말도 인용하는 식이다. ‘닻내림효과’ ‘프레이밍효과’ ‘기대효과’ ‘관성효과’ 등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얘기도 다양하게 펼쳐보인다.
그는 “이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계몽주의는 패배의 길에 들어서고, 감성을 강조하는 영국 계몽주의가 승리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덧붙인다.
“실패로 끝난 정책은 인간 행동에 대한 천박한 사회과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제안한 사람들은 계량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만 안심하는 좀스러운 꼼꼼쟁이들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선물이 무의식이란 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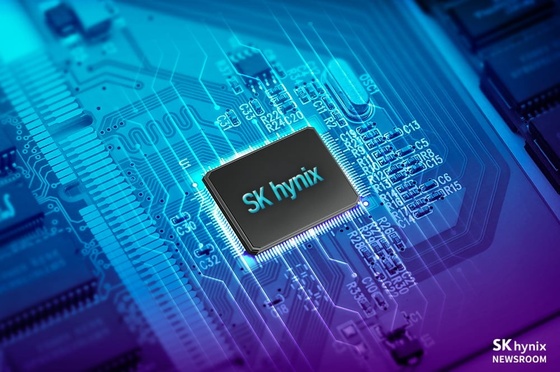
![금리인하 '연내 1회' 축소에도…S&P·나스닥 또 최고치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7767.1.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