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의 곁에 두고 싶은 책] 음양이 조화된 진경산수, 앉아서 '천하명산' 유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성희의 곁에 두고 싶은 책] 음양이 조화된 진경산수, 앉아서 '천하명산' 유람](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1111057091&indate=20111110&photoid=201111106347&size=1)
전통미술 특히 조선 중 · 후기 회화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커진 건 무엇보다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69)의 공이다. 그는 공부와 결혼한 사람이다. 서울대 사학과를 나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를 거쳐 1966년 간송미술관으로 옮긴 뒤 45년째 미술관에서 생활하며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그는 특히 겸재 정선(鄭敾 · 1676~1759)의 재조명에 힘썼다. 그는 조선의 정치 · 사상적 맥락을 속속들이 파헤침으로써 겸재를 화원이 아닌 율곡 이이(李珥) 중심의 조선 성리학을 바탕으로 18세기 이 땅에 꽃핀 진경문화 주역으로 되살려냈다.
《겸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은 그런 노력을 모은 책이다. '겸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그린 진경이 바로 금강산이다. 백색 암봉은 북방계의 강한 필묘로,수림이 우거진 토산은 부드러운 남방계의 묵묘로 처리해 극단적인 음양 대비를 보이면서,화면 구성에선 반드시 육산이 골산을 포근히 감싸는 음양조화의 성리학적 우주관이 적용되는 신화풍을 창안했다. '
'풍악내산총람' '장안사''백천동''정양사''만폭동''비로봉''불정대''구룡연''삼일포' 등 71점의 도판과 상세한 설명은 천하명산이란 금강산의 절경에 새삼 탄복하게 한다. 제시(題詩)와 관련 문헌에 대한 꼼꼼한 해석은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옛글을 읽는 즐거움을 보탠다.
감탄만으로 일관하지도 않는다. '보덕굴'에 대한 평이 그것이다. '금강천 긴 물줄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표현해보려고 화면의 중앙에 굽이굽이 모두 다 그려 놓았다. 벽하담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이어진 이 물줄
![[박성희의 곁에 두고 싶은 책] 음양이 조화된 진경산수, 앉아서 '천하명산' 유람](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1111057091&indate=20111110&photoid=201007122117&size=1)
전통문화를 지키고 가다듬는 일이 왜 중요한지 밝힌 대목은 실로 절절하다. '세상의 어떤 문화도 자생문화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없다. 외래문화를 자기화할 수 있는 자체 수용능력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고유문화로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정복 소멸돼 자기 색채를 잃기도 할 뿐이다. 자체 수용능력이란 축적된 문화역량이다. 고유색을 가진 전통문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외래문화를 어느 정도로 자기화해낼 수 있느냐 하는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박성희 수석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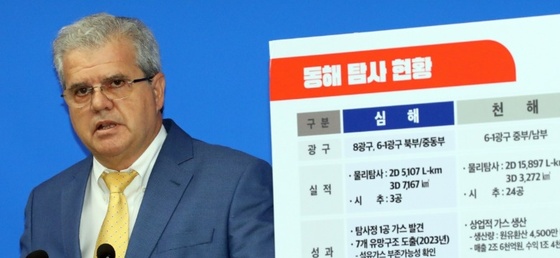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뉴욕증시-주간전망] 연준, 물가 보고서와 애플](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7517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