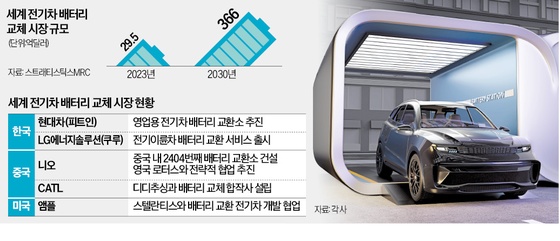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책마을] 어! 비싼 물건이 더 잘 팔리네…당신이 속고있는 '가격의 비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격은 마음 속 욕망의 숫자…적정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 전략
1994년 미국 뉴멕시코주에 살던 81세의 스텔라 리베크 할머니는 맥도날드의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고 다리와 엉덩이에 피부 이식수술을 받는 데 1만1000달러를 썼다. 리베크 할머니는 맥도날드 측에 2만달러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800달러만 주고 입막음하려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리드 모건은 '맥도날드는 286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심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신이 속고 있는 가격의 비밀'이란 부제를 단 《가격은 없다》의 저자는 제목 그대로 "적정 가격이란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가치라는 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며 유령의 집 거울에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가격을 매긴다는 건 마음속 욕망을 숫자라는 대중의 언어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맥도날드가 물었던 천문학적 배상액 대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긴 하지만 사회과학적 해석을 조금 뒤로 하고 보면 그 잘못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통상 가격이란,구체적으로 '유보가격'이란 구매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고의 가격 혹은 판매자가 받기를 원하는 최소의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복권소송'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맥도날드 거액 송사의 '가격(금액)'은 '상품(사건)'의 전후 사정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정의 배심원 감정을 자극한 변호사의 기막힌 변론과 그에 따른 여론에 좌우된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모건이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호소한 변론은 이랬다. "배상액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270만달러는 맥도날드가 단 이틀만 커피를 팔면 버는 돈입니다. "
저자는 '일관된 자의성'이란 용어로 가격을 설명하기도 한다. 모양이 똑같은 15㎏짜리 가방과 18㎏짜리 가방 중 어느 것이 무거운지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저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 가방이 공항에서 20㎏ 수하물 제한에 걸리게 될지 아닐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할 때는 안정적이고 일관되지만 절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엔 매우 변덕스럽고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다소 딱딱하지만 중간중간 말랑말랑한 이야기도 많다. 상자 크기는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어드는 시리얼이나 제품의 모양을 바꿔 중량을 줄이는 아이스크림처럼 식품회사들은 '경제적 용량'이란 이름으로 소비자의 눈을 속인다. 가격에 대한 기억은 짧고 상자와 포장에 대한 기억은 더 짧다는 인간의 뇌 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카드회사와 그 제휴사들은 단돈 5000원을 아끼기 위해 건넛마을로 차를 몰고 가고,500원 할인쿠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간파해 포인트 적립이라는 '짠돌이' 대상 마케팅을 펼친다. 비싸야 잘 팔린다는 속설을 유감없이 마케팅에 활용한 극장 좌석등급제도 있다. 한 장에 480달러짜리 브로드웨이 쇼 티켓이 나왔다는 것은 평소 구입할 엄두도 못 내던 사람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심어준다.
이 티켓의 존재는 팬들이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든지간에 자신들이 구입한 가격이 480달러보다 낮다면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69센트짜리 물건을 99센트 스토어에 갖다 놨더니 매출이 수직상승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혀를 내두르게 된다.
돈에 열광할수록 돈에 둔감해진다는 '지수법칙'에 관한 연구 사례들도 눈길을 끈다. 사회적 지위를 두 배로 높이고 싶다면 소득은 2.6배 증가해야 하고, 도둑질의 심각성은 훔친 돈의 크기에 비해 아주 천천히 증가한다. 도둑질한 행동이 두 배로 더 심각하게 보이려면 60배의 돈을 훔쳐야 한다. 달리 말하면 느끼고 있는 무게를 두 배 더 무겁게 느끼게 하는 데는 1.6배만 무거우면 충분하고 전기 충격은 1.2배만 늘려도 사람은 두 배의 쇼크를 겪게 되지만,돈으로 인한 자극은 두 배가 아닌 많게는 수십배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의 문자메시지 가격정책에 대한 비난에선 격한 감정도 느껴진다. 저자는 "문자메시지 처리 비용은 아무리 많아도 1000분의 1센트로 사실상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에 그냥 업혀가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요금을 매기는 것을 보면 마치 고등학교의 심술궂은 패거리들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이 아침의 배우] '철의 여인' 메릴 스트리프, 할리우드 유리천장 깨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2501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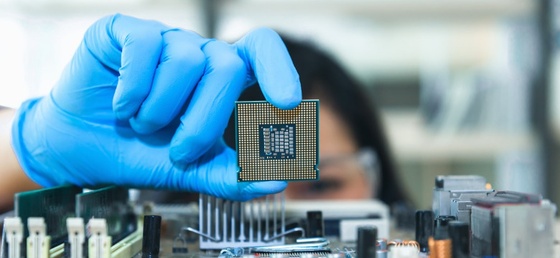
![금리인하 '연내 1회' 축소에도…S&P·나스닥 또 최고치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7767.1.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