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조선 왕들의 질환과 처방 비법
성종은 밤의 제왕이었다. 밤마다 잔치를 열어 후궁 기생과 어울렸다. 25년 재위기간에 세 명의 왕후와 아홉 명의 후궁을 맞아 16남12녀를 두었다. 그의 죽음은 호색적인 밤생활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당뇨로 인해 신장이 망가지면서 급사한 것이다. 주색을 즐긴 방탕한 생활이 원인 중 하나였다.
한의사 이상곤 씨가 《낮은 한의학》에서 열거한 조선 왕들의 질환사가 흥미롭다. 이씨는 서양과학의 기준에서 본 한의학의 접근법은 과학적이지 않지만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조선시대 한의학은 어전회의에서 삼정승과 당대 지성들이 모여 토론할 정도로 논리정연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왕과 대신들을 치료하는 역사적 임상 현장으로 안내한다.
도가의 정기신(精氣神) 이론에 기반한 《동의보감》의 사상적 배경을 찾아 서경덕과 박지화로 이어진 경기 파주 일대의 재야 철학자들 서재 속으로 눈길을 돌린다. 소현세자와 정조 등에 얽힌 독살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처방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기도 한다. 한의학의 지혜와 현대의학 지식을 결합한 공진단,경옥고,우황청심환 등의 처방과 한약재에 대한 설명도 새롭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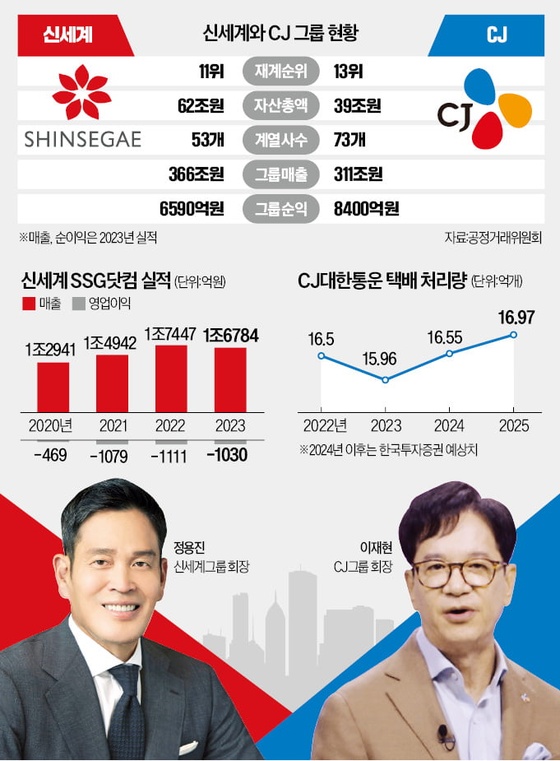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서울시향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444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