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한 우물만 파는 장인정신이 일본의 위기 불렀다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는 한 · 일 경제 분위기의 역전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디지털 시대'와 '모듈화'를 꼽는다. 많은 부품의 규격이 통일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각각의 부품을 일일이 연결하는 조정과 통합 기술보다 전체적 설계와 모듈화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조정과 통합 기술에서 압도적인 일본은 이런 디지털화 물결에 올라타지 못했다. 일본식 장인정신이 하나의 요인이란 게 저자의 분석이다.
일본의 장인정신은 적당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좁고 깊게 한우물만 판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완벽만 추구하는 좁은 영역,즉 우물에 갇혀 고립된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잃을 기술이 별로 없던 한국 기업은 디지털 시대에 신속 대응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며 규격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이긴다. 시장을 선점하면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다. 한국 기업은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 스피드 경영을 실천했다. 그 결과 네트워크 효과를 누렸으며 사실상 표준을 만드는 기회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실질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외활동만 하는 일본의 '주군경영'에도 쓴소리를 한다. 현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풍토여서 최고경영자들의 위기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한국 기업은 오너가 전권을 행사하는 '황제경영'의 혜택을 누렸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선박가격이 급락하던 1993년 도크 증설을 결단,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8년 트렌치 방식이 아닌 최신 스택 방식의 반도체 생산기술 도입을 결정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혜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여기는 바젤] 그림보다 굿즈? 54년 만에 첫 '아트숍'](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0655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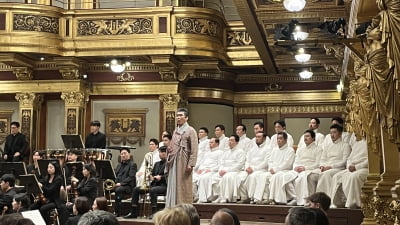


![논란의 560억 달러 결국 받는다…"자율주행 전환 큰 진전"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4072306907.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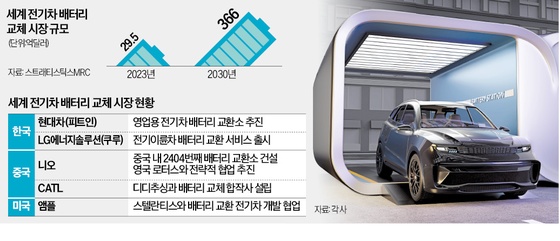





![[신간] 사소한 것들의 인문학·변화에 능숙한 삶](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70322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