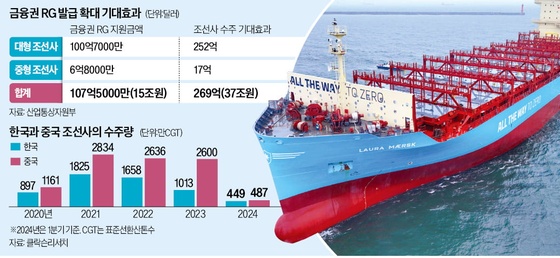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정규재 칼럼] 妖僧 묘청의 세종시 천도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종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묘청의 서경천도론을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고려사는 서경 천도가 추진되는 7년 동안 서경에 궁궐을 짓는다 성곽을 쌓는다며 백성들만 죽을 고생을 했다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세종시 인근 주민들만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천도론은 이미 헌재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을 노무현 정부가 갖은 꼼수를 궁리한 끝에 행복도시라는 실로 기만적인 간판으로 바꾸어 내걸었다. 법 질서에 대한 반항심리였던 것이고 1000년래 사기극이 바로 행복도시다. 돈을 주고 표를 샀던,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의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세종시다. 묘청이 서경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갖은 사술을 동원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감언이설로 혹세무민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동강 바닥에 기름 떡을 묻은 다음 물 위에 떠오른 기름을 용의 침이라며 술수를 부린 것은 신채호조차 어이없어 했던 사기극이다. 과천에 있는 행정부처를 뜯어다 충청도로 옮기면 저절로 지역 발전이 된다는 논리는 강물에 떠오른 오색 기름을 상서롭다고 했던 사술과도 멀지 않다. 정치인들 또한 겉으로는 고래고래 목소리를 높이면서 속으로는 누군가가 이 정신 나간 일을 중단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속내들이다.
국회가 지금의 여의도 하류 쪽에 자리를 잡은 것이, 국회를 섬으로 보내고 풍수상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위치시켜 국회의 기를 꺾으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도였다는 풍문도 없지는 않지만 21세기라고 해서 묘청식의 사술이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닌 모양이다. 여기에 수용토지를 둘러싼 돈다발 문제까지 얽혀 있고 대중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정치인들의 지역선거 당락까지 걸린 문제다. 없던 일로 했다가는 묘청의 난이라도 다시 터질 지경이다. 그러나 지구의 허다한 국가 중에 행정부를 떼어내 빈 땅에 보내는 나라는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걸어서 5분,멀어야 15분 거리 내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들의 지리적 배치다. 행정부처를 관악산의 남쪽 경사면으로 옮겼던 것은 75년 당시 정권의 자기 최면적 안보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조폭들처럼 떼거리로 승합차를 타고 남태령을 넘어 청와대로 국회로 우루루 몰려다니던 우스꽝스런 풍경이 일상사가 되었다. 이제는 전 국민이 관공서와 민원기관을 찾아 전국으로 헤매고 돌아다녀야 하는 실로 웃지 못할 사태로 확대 증폭되기에 이른 것이다.
차라리 국회와 정치인들을 세종시로 옮기고 과천 청사는 다시 제 위치인 광화문에 옮겨놓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과 다리를 편안케 하는 지름길이다. 행정부처와 공사 등 정부기관을 제 호주머니 떡 나누어주듯 이 동네 저 마을로 팔아먹으며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유지한 것은 요승 묘청보다 더한 사술이다. 고려 인종은 대동강 기름 떡 사건을 수사한 끝에 사기극의 전말을 밝혀내고 천도론을 공식 폐기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볼 것인가.
정규재 <논설위원 경제교육연구소장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합참 "북한군 20~30명 또 MDL 침범…경고 사격에 북상"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68920.3.jpg)
![[포토] 국회 운영위에서 인사 나누는 박찬대·천하람 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69036.3.jpg)


![뉴욕증시, S&P500 또다시 사상 최고...테슬라 5%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80635366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