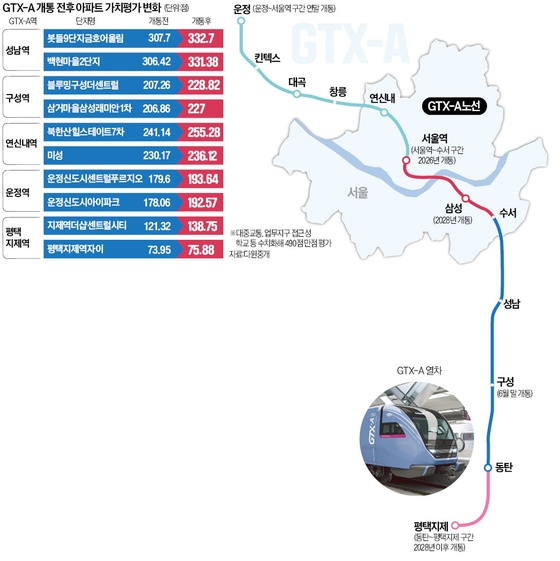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기업 흥망의 '다윈코드'⑤] 필립스, 고객 취향 앞지른 CD-i로 위기에 빠지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80년대 CD개발로 잘 나가던 필립스
고객 취향 앞지른 CD-i로 위기에 빠지고…
60년대 미니컴퓨터로 시장주도한 DFC는 자신만의 기술 몰두로
변화된 환경 적응에 실패하고 '바이오' 노트북 마니아층을 포기한
소니는 진화를 멈추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성공과 실패라는 현상의 이면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 있다. 즉 응전은 일종의 변이다. 변이가 자연의 선택을 받으면 개체수가 늘어나듯 제대로 된 응전은 기업을 성장으로 이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분초를 다투는 속도로 변한다.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 성공의 계명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저명한 경영학자인 톰 피터스의 치욕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1982년 글로벌 43개사를 선정해 모순관리 고객밀착 핵심사업 집중 조직단순화 등 8가지의 성공 요인을 찾아내 발표했다. 하지만 5년 후 해당 기업의 60% 이상이 도산하고 말았다. 기업의 역사는 진화에 정답이,일정한 룰이나 방향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필립스의 낭패
1982년 소니와 필립스는 LP와 테이프를 골동품으로 만들어 버린 CD를 개발,출시했다. 대성공이었다. 두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인 DVD까지 개발한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잇따른 성공에 고무된 필립스는 CD-i(interactive)라는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TV에 부착해 컴퓨터게임도 하고 주문형비디오(VOD)를 보고 백과사전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제품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청자들은 쌍방향 서비스까지 원하지는 않았다. 소비자들의 미래 취향을 너무 앞질러 나간,완벽한 실패였다.
그 결과 필립스는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마쓰시타와 도시바에 제조 라이선스를 매각함으로써 CD와 DVD 생산주도권은 일본의 경쟁자들에 넘어갔다. 동시에 유럽 최대 전자회사로서 필립스의 위상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헬스케어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는 요즘의 필립스는 굳이 전자회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형해화 됐다.
# 올슨의 착각
디지털이큅먼트(DEC)라는 회사도 변이에 실패한 후 컴팩에 합병되는 도태를 맛봤다. 1960년대 DEC가 만들어낸 미니컴퓨터는 컴퓨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썼다. 창업자 케네스 올슨을 비롯한 DEC 직원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과 견고함을 갖춘 VAX 시리즈를 만들어 판매했다. 미니 컴퓨터는 컴퓨터를 중소기업의 사무자동화 도구로 변신시켰다. 또 VAX는 신뢰성의 신화를 탄생시키며 DEC를 스타 기업의 반열에 올려놨다.
하지만 지나친 장인 정신을 발휘한 것일까. 이 회사는 기술지상주의에 빠졌다. 기술직 사원을 우상화하고 영업직,관리직은 무시했다. 기업을 망치는 징후는 또 있었다. 좀 더 작고 싸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고객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작품에 몰두한 것이다.
이런 오만함은 올슨이 1977년에 한 말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개인적으로 집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 그로부터 4년 후 IBM은 PC를 출시하고 애플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개인PC 시대를 열었다. 이후 DEC는 뒤늦게 4차례나 PC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1998년 컴팩에 합병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 소니의 교만
소니도 진화를 멈춘 케이스다. 아니 퇴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 실패를 논하기 이르지만 지금의 소니는 꿈의 노트북 '바이오'를 처음 출시했던 그때의 소니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소니는 집채만한 트랜지스터를 휴대용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꿈을 현실로 만든 회사다. '바이오'를 만들 때만 해도 그랬다. '바이오'를 만들었던 팀의 목표는 '사람들이 노트북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기능을 갖춘 노트북을 만드는 것'이었다. 팀원들은 업무시간이 끝나면 하나 하나 작업실로 모여들었다. 젊은 열정이 매일 밤 모닥불처럼 사무실을 밝혔다. '바이오'는 출시된 후 마니아 층이 가장 선호하는 노트북 브랜드로 떠올랐다.
마니아들은 비싸도 대가를 지불한다. 마니아들이 '바이오'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돌자 얼리 어댑터들이 '바이오'를 사기 시작했고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 '바이오'는 단기간에 노트북의 고급 브랜드로 부상했다.
하지만 성취가 주는 달콤함에 취한 소니 경영진은 이때부터 중대한 착각을 범한다. 마니아 고객층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비슷한 성능만 있어도 '바이오'라는 브랜드만 붙이면 잘 팔리는데 굳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실제 일정기간 '바이오'는 인기를 유지했다. 하지만 '바이오'가 세상의 수많은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니아들은 서서히 '바이오'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노트북 사용자들도 '바이오'에서 등을 돌렸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 데도 변이가 스스로 환경을 무시해 버린 케이스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액트지오 "성공률 20%…'40억 배럴' 가이아나보다 유망"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6099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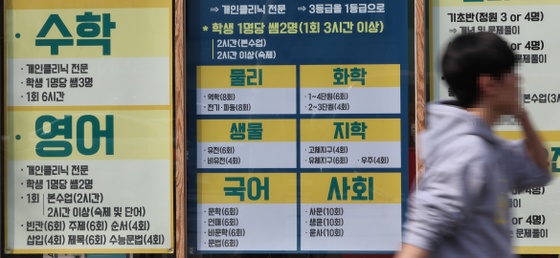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