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윈에게 배우는 불멸의 특권] 新질서 온다… 기업 '흥망의 코드'를 풀어라
역사는 글로벌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당면한 고통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알려준다. 실제 모든 위기가 그랬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역설적으로 미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키운 자양분이었다. 독일은 2차대전 패전의 아픔을 딛고 1950년대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구현하며 유럽 최고의 공업국가로 발돋움했다. 한 세대를 풍미한 일본의 경소단박(輕小短薄)은 또 어떠했던가. 전 세계를 전율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 이후 찾아낸 회심의 전략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서 꿈틀거린다. 영원 불멸은 없다고 하지만 생(生)-로(老)-병(病)-사(死)라는 변화 자체는 영속적이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찰스 다윈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 변화가 새로운 종(種)과 생태계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변화에 대한 도전과 기회 포착이야말로 생존 역량을 배가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갈파했다. 이 같은 생명의 비밀이 '다윈 코드(Darwin Code)'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업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작금의 위기 국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적 구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물에 가깝다. 생존과 성장 욕구,탄생과 소멸 과정 또한 자연계의 생물들과 꼭 닮았다.
근거없는 낙관은 금물이지만 섣부른 절망은 더욱 치명적이다. 식품업체 켈로그는 대공황을 기점으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당시 1위 기업이던 포스트는 불황이 닥치자 원가 절감에만 급급했다. 반면 켈로그는 대공황으로 양산된 극빈자들에게 시리얼을 무료로 배급하는 등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했다. 경제위기가 지나자 미국인들은 '시리얼=켈로그'라는 등식을 받아들였다.
이번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릴 게 분명하다. 위기는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것 같지만 언제나 남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패러다임이다. 강력한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시기에 '뉴 패러다임'을 선취하는 자가 다음 질서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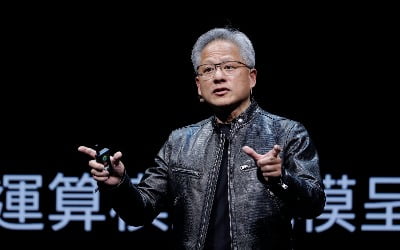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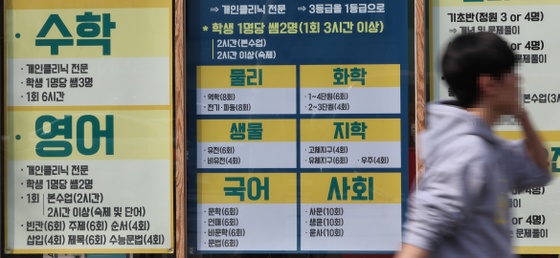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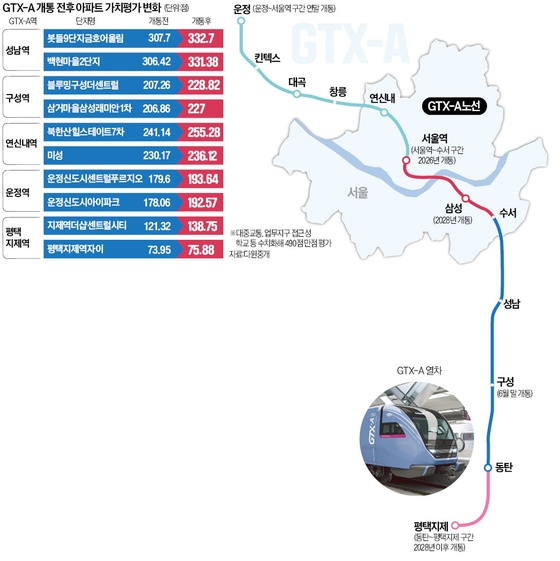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게임음악 선입견 바꾸는 RPG 콘서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259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