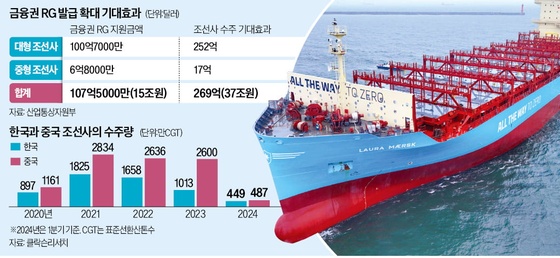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아마고수들의 '골프이야기'] "올바른 그립이 고수되는 지름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빈 < 치과의원 >
치과의사 가운데 골프를 가장 잘 치는 사람으로는 김영빈 원장(53)이 꼽힌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김영빈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지난 1981년 골프를 시작했다.
"입문 초기에 시간만 나면 하루에 몇차례라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골프이론서도 많이 봤구요.10개월만에 77타를 기록했습니다."
3년쯤 지나 '완벽한 싱글'이 된 김 원장은 골프장 클럽챔피언전에 여러 차례 도전장을 냈다.
나가기만 하면 4강에 올라 '김준결''김결승'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클럽챔피언전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치러진다는 판단이 선 다음부터는 더 이상 출전하지 않았다.
"골프에서 룰을 지키지 않고 잘 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스코어카드에 맘에 드는 스코어를 적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도 드롭 요령이나 해저드 말뚝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드물어요. 골프 매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눈치껏 배우며 익힐 수 있지만 룰은 반드시 따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테니스를 즐기던 김 원장은 골프를 배운 뒤에도 테니스 라켓을 놓지 않았다.
골프와 테니스를 동시에 즐긴 지 25년 정도 됐다.
"테니스의 경우 어깨가 나가면서 공을 때리기 때문에 골프에서는 훅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테니스를 꾸준히 하면 허리와 다리가 좋아져 파워가 생기는 이점이 있지요."
김 원장이 골프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그립'이다.
"어떤 골퍼든 '멘탈'을 내세우지만 저는 경험이 쌓이면 집중력이나 멘탈은 저절로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스윙을 제대로 하려면 그립이 잘 돼야 합니다.
저의 경우 멘탈이나 쇼트게임 등이 좋았지만 아이언샷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그립에서 찾아냈지요."
그는 현재 골프와 테니스의 그립을 동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른손으로 '히팅'한다는 점에서는 원리가 같다는 생각에서다.
"그동안 테니스는 라켓을 약하게 잡으면서 컨트롤 위주로 쳐 왔고 골프는 훅그립을 해 강하게 쳐 왔어요. 이를 혼용하다보니 샷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더군요. 테니스 그립을 스퀘어하게,골프 훅그립도 스퀘어하게 조정하면서 샷이 좋아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한 김 원장은 "시니어대회와 아마대회에 나가 상위권 입상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