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GPT-3에 하라리 책·논문 학습 시켜
서문 쓰도록 했더니…
"정말 AI가 썼단 말인가…마음이 복잡해졌다"
AI가 작가 대체할까
美서 최근 AI작가 책 나왔지만
아직은 인간 작가 있어야 글 쓸 수 있는 수준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선보인 <사피엔스> 10주년 특별판 서문의 일부다. 인류의 기원과 잠재력을 탐구해온 하라리의 고민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라리가 쓴 글은 아니다. 대필을 맡은 건 현재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AI) 글쓰기 프로그램 ‘GPT-3’다. 하라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인류의 앞날을 미리 보여줬다’는 석학조차 예상치 못할 정도로 AI 출판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라리 “AI가 썼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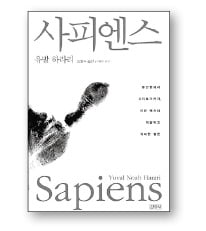
AI는 하라리의 책과 논문, 인터뷰 등을 끌어모아 글을 완성했다. 하라리가 이제껏 했던 말을 짜깁기한 수준이지만, AI가 썼다고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줬다. 하라리는 서문을 공개하며 AI 서문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을 뿐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도 없었다”고 전했다.
하라리는 고백한다. “나를 구현해낸 GPT-3의 글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글을 읽는 동안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AI가 이 글을 썼단 말인가?”
그는 무엇보다 변화의 속도에 놀랐다고 했다. 하라리는 “2010년 <사피엔스>를 집필할 때 나는 AI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10년이 지난 현재 AI 혁명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이 혁명은 우리가 알던 방식의 인류 역사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썼다.
AI 작가 몰려온다
서점가에서는 단순히 서문에서 그치지 않고 AI가 본격적으로 집필에 참여한 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출간된 <파르마코-AI>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구글 AI의 ‘예술가와 기계 지능’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K 알라도맥다월과 AI 언어 모델인 GPT-3가 함께 쓴 이 책은 철학적 사유를 담은 에세이이자 문화비평서다. 200여 쪽 분량에 사이버펑크, 기억, 언어, 기호학, 자아, 생태 등의 주제를 자유롭게 넘나든다.사람인 알라도맥다월이 글을 쓰다 바통을 넘기면 GPT-3가 이어 쓰고, 또 어느 순간 다시 인간 저자가 글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집필했다. AI가 제시한 문장들은 완결된 문장의 형식을 갖췄다. 저자는 “가독성을 위해 일부 자잘한 철자, 문법 오류를 수정하고 구성 방식에 변화를 주긴 했지만 그 외의 편집은 없었다”고 했다.
책을 낸 워그룸프레스 출판사 관계자는 “문학적으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책을 냈다”며 “인간 저자와 AI가 번갈아 썼지만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 말했다.
AI를 통한 출판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작년에 AI가 쓴 국내 최초의 장편소설 <지금부터의 세계>가 나와 화제가 됐을 때는 사람이 개입했다. AI로는 완전한 창작이 불가능했던 까닭이다. 심지어 진짜 AI가 쓴 건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GPT-3처럼 프로그램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쓴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를 중국에서 펴냈고, 2018년엔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AI 소설 <길 위 1번지>가 미국에서 출간됐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구은서/임근호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