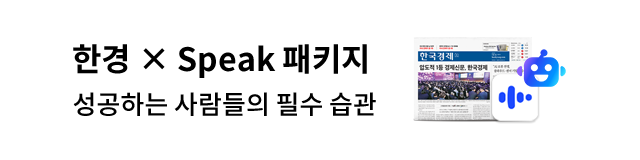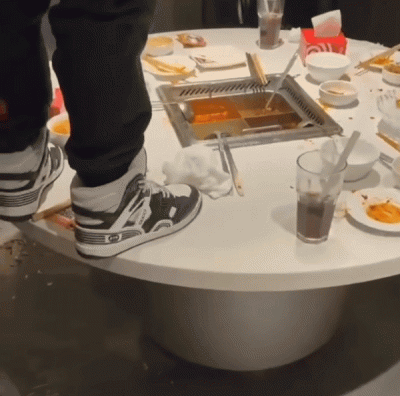"12시간 연장근로 기준은 '1주간'"
노동계 "과로사 조정 판결" 반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 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모 씨는 2013~2016년 총 130회에 걸쳐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 씨의 회사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이 회사의 1주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가 12시간을 넘는지를 따져 이모 씨가 3년간 109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시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는 같은 법 제50조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서 1일 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그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하급심 판결과 실무에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해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시했다"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문언, 연혁,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방식이 항소심 법원의 방식보다 연장근로를 항상 과소 계산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선고를 접한 노동계는 “과로사 조장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 노동단체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상관없다는 산식을 내놨다”며 “하루에 21.5시간을 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