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뒤흔든 '그레이 파워'] 고령층에 휘둘리는 日 정치권…1년마다 총리 교체
선거후 공약은 공수표·정계는 혼돈으로
일본 총리의 단명은 유권자의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적 이유가 그 배경이다. 1950년 5.0%에 불과했던 일본의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5년 20%를 넘어섰고 작년 말에는 23.3%까지 높아졌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55년이 되면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늙어가는 인구구조는 선거의 판세도 뒤바꾸고 있다. 일본 전체 유권자 중 20~30대 비중은 1980년 45.4%에서 2010년엔 30.2%로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유권자 비중은 같은 기간 18.7%에서 38.1%로 높아졌다. 주력 유권자 층이 역전된 것이다. 고령 유권자의 득세로 정치권은 중장년층의 눈치만 보게 된다. 게다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에도 적극적이다. 정치인들이 매번 포퓰리즘 색채가 강한 복지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선거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의 세대 간 불평등이다. 일본의 27세 젊은이가 평생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평균 1978만엔이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평균 연금은 1265만엔에 불과하다. 낸 돈에 비해 713만엔 손해를 보게 된다. 반면 62세인 실버세대는 1436만엔을 내고 1938만엔을 받는다. 502만엔 더 받는 구조다. 젊은이들은 당연히 불만이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연금 적립 방식을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온다. 그러나 실버 유권자들이 무섭다. 매번 연금구조 개혁 방안은 뒷전으로 밀린다. 어느 당이든 집권하고 나서 나라 곳간을 열어본 뒤엔 생각이 바뀐다. 공약으로 내건 노인용 복지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말 기준으로 237%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다. 결국 공약은 공수표가 되고 선거는 다시 처리진다. 실버 유권자들은 더 센 포퓰리즘 공약을 내건 후보에 표를 몰아준다. 일본의 정치는 그렇게 멍이 들고, 단명 총리는 매년 보따리를 싸게 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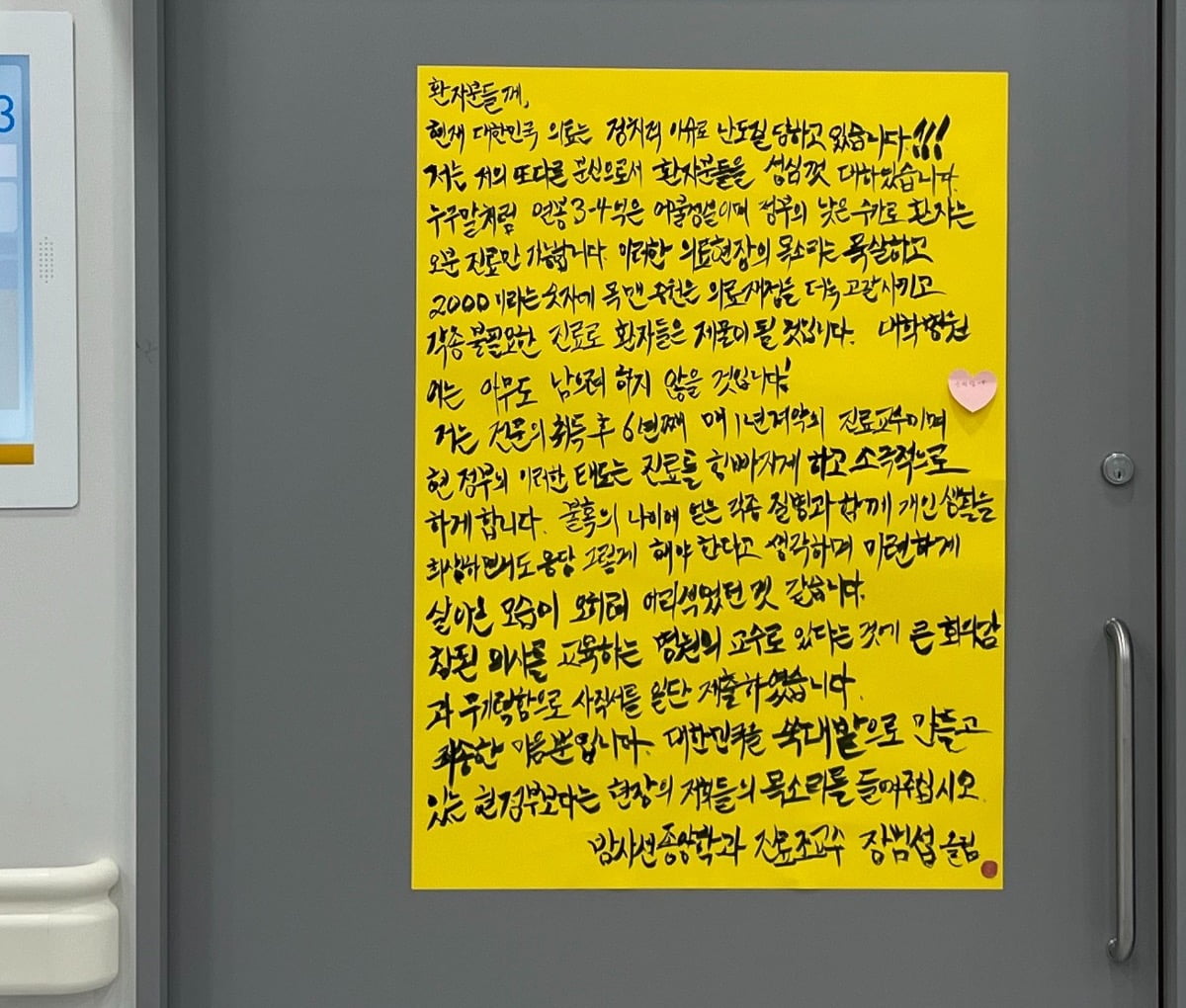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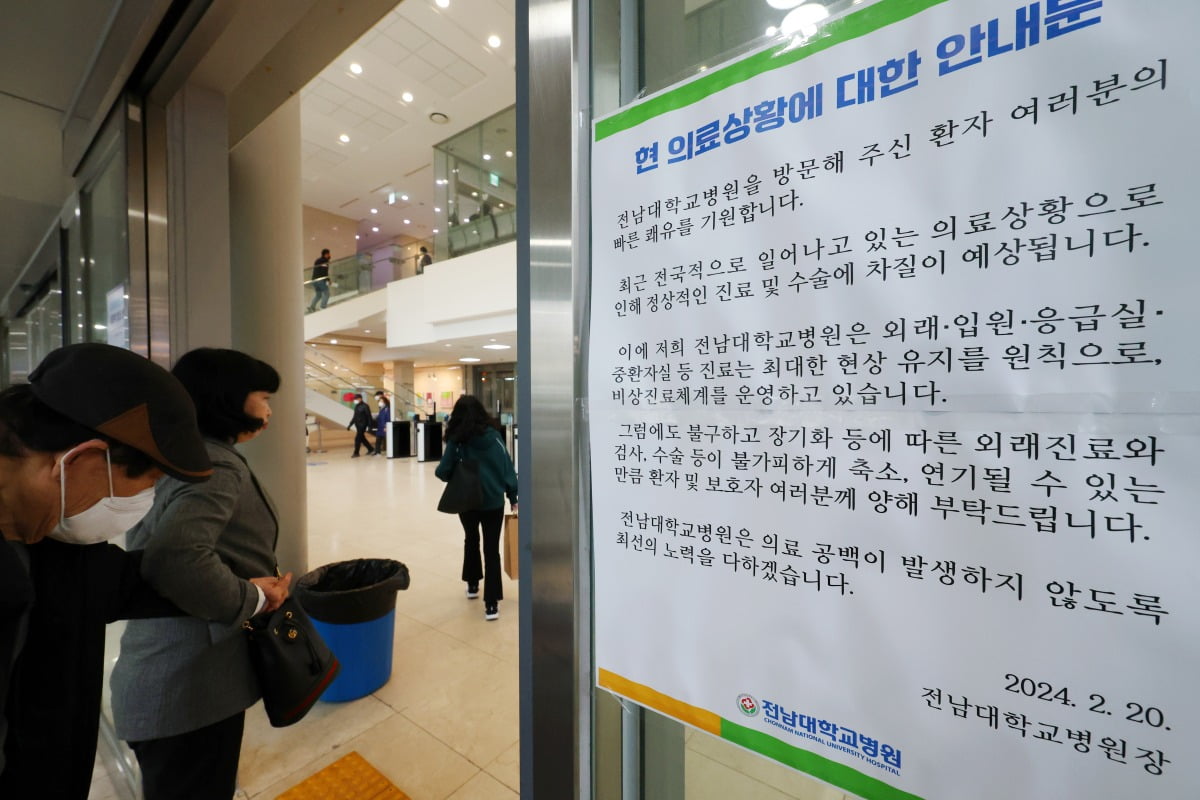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