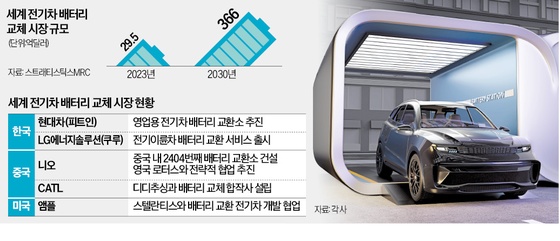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사설] 산적한 과제 앞둔 김영섭 KT號…더이상 정치적 외풍 없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는 게 김 신임 대표의 당면 과제다. KT는 지난해 11월 연임 도전에 나선 구현모 전 대표를 비롯한 전임 경영진의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의혹 등이 겹치며 경영 혼란을 빚었다. 차기 대표 선임이 난항을 겪으면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상당 기간 미뤄졌다. 김 대표는 내부 단합을 이끌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 체질 개선은 물론 ‘디지코’(디지털 플랫폼 기업)를 잇는 신성장 전략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가 엊그제 취임식에서 “숫자를 위해 적당히 타협하기보다 사업의 본질적 강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를 주문하고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뛰어난 역량이 있으면 핵심 인재로 우대하겠다”고 밝힌 데서 변화 의지가 읽힌다.
KT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외부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자(CEO)가 바뀌는 흑역사가 반복돼온 사실은 따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 부족을 ‘카르텔’로 규정하며 요금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고질로 꼽혀온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등 각종 논란의 배경에도 외풍이 자리 잡고 있다. 벌써부터 자회사 대표 후보로 정치권 인사가 거론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KT는 연간 매출 25조원, 임직원 5만8000여 명, 52개 계열사를 보유한 국내 간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최대주주(국민연금) 지분율이 8%에 불과한 데다 소액주주 비중이 65%, 외국인 비율도 40%에 이를 정도로 소유 분산이 잘 돼 있다. 여기에 정부 지분은 한 주도 없다. 그런데도 준공공기관처럼 부려온 게 그간 정권 행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 몫이었다. 내부의 ‘고인 물’이나 정관계 출신 ‘낙하산’이 아닌 외부 전문경영인 사령탑에 대한 시장 기대가 크다. 하지만 외풍이 지속되면 아무리 좋은 경영인과 지배구조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인사와 경영에서 일절 손을 떼는 게 김영섭호(號)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논란의 560억 달러 결국 받는다…"자율주행 전환 큰 진전"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40723069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