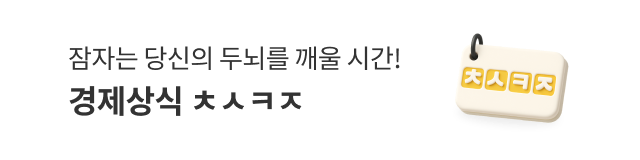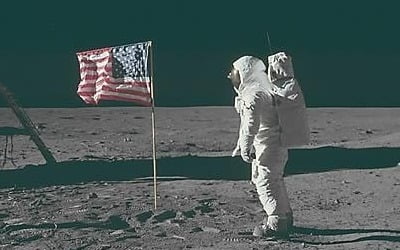발사일정 19개월 늦춰
2022년 7월에야 발사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달 탐사선 발사 일정을 당초보다 19개월 늦춘 2022년 7월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상세설계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6년부터 개발한 달 탐사선(궤도선) 목표 중량은 원래 550㎏이었다. 그러나 궤도선 시험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졌다. 이 중량으로 260L 연료탱크와 탑재체 6개를 싣고 1년간 달 주위를 돌며 임무 수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탐사선엔 국내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달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시험장비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음영지역 촬영 카메라 등 총 6개 탑재체가 실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들 간에 기존 설계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립해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사업 전반을 점검한 결과 중량을 678㎏으로 높이도록 했다. 당초 원궤도(장·단반경 100㎞)에서만 운항하도록 한 계획을 바꿔 9개월은 타원궤도(장반경 300㎞, 단반경 100㎞)에서, 3개월은 원궤도에서 하도록 변경했다. 원궤도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확한 궤도는 NASA의 조언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다.

달 탐사 계획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12년 전 노무현 정부는 2020년 달 궤도선 발사, 2025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세웠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각각 2017년, 2020년으로 앞당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20년, 2030년으로 다시 바뀌었다.
첫발도 못 뗀 한국과 다르게 경쟁국들은 숨가쁘게 달로 향하고 있다. 탐사선 발사 및 운영을 통해 우주통신 및 항법기술, 라이다, 사물인터넷(IoT) 등 고급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올 들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선(창어 4호)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2007년 달 궤도선을 발사해 당시 최초로 HD급 영상을 촬영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달 탐사선 ‘베레시트’를 보냈다. 착륙 지점 10㎞를 앞두고 궤도를 이탈했지만 이스라엘은 곧바로 신속한 재발사 계획을 밝혔다. 인도는 7월 궤도선과 착륙선을 동시 탑재한 ‘찬드라얀 2호’를 발사했다. 찬드라얀 2호 착륙선은 비록 연착륙에 실패했지만 궤도선은 정상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우주청’ 설립 목소리 높아져
우주개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처 간 조정이 가능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두고 우주개발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의 위상이 너무 낮아 비전 제시, 정책 수립, 부처 간 의견 조정, 국제 협력 등에서 어떤 역할도 하기가 어렵다”며 “우주개발 전략의 총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부서는 과장급 조직인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 단 두 곳뿐이다.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수십 개 출연연구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도 우주청 설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주청 신설에 대해 학계와 업계, 부처 간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