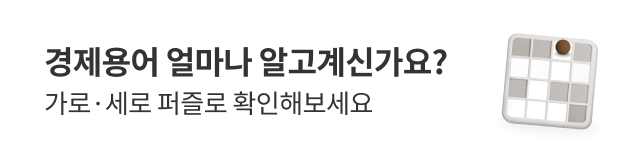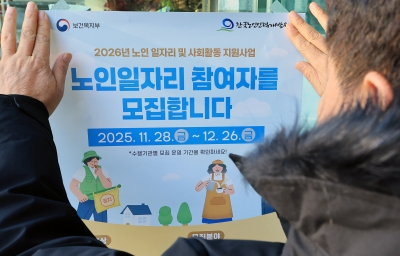"증원 정책으론 소청과 붕괴 못 막아"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을 전공의 수료를 앞둔 4년 차 김혜민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0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병원 중 한 곳이다. 소속 소아과 1~3년 차 레지던트들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는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 중 올해 유일하게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김 의국장은 "타과를 지원하다가 떨어져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소아청소년과가 3년제로 바뀌어서 지원한 것도 아니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선택했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선택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운을 뗐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현재 셋째를 임신 중이라는 그는 "소아청소년과는 인력 부족이 극심하기 때문에 임신부여도 정규 근무는 당연하고 임신 12주차 전, 분만 직전 12주 전을 제외하고는 기존 당직 근무에 그대로 임한다"며 "저는 최고 연차이기 때문에 당직도 일반 병동이 아닌 중환자실 당직만 서고, 태교는커녕 잠도 못 자고 컵라면도 제때 못 먹는다. 아파도 '병가'는 꿈도 못 꾸고 수액 달고 폴대를 끌어가며 근무에 임해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당직 시간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온 환아를 50분 동안 심폐소생술한 적이 있는데 가슴 압박을 하면서 '내 뱃속 아기가 유산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엄마이기 전에 나는 의사니까 지금은 처치에 집중하자'고 다짐하며 임했다"면서 "다행히 환아가 살아난 후 오랜 처치가 끝나고 당직실로 들어가서는 배 속의 아기에게 엄마로서 죄책감이 들어 몇 시간을 울었다"고 토로했다.
또 "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과라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 입원 전담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정부의 지원 역시 없어 교수와 강사들이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꾸며 이제는 정말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 의료 붕괴 해결책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5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의대 증원 정책은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의사가 5000명(연간 의대정원)이 되고, 소청과를 3년제로 줄인다고 해도 소청과 의사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원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소청과 트레이닝을 지속했던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껏 제 앞에서 떠난 아이들의 마지막 눈빛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파업을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 동시에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들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면서 "소아청소년과를 같이 하자고 후배들에게 더 이상 권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라면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면허가 있더라도 소아환자 진료를 보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겠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못다 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워보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