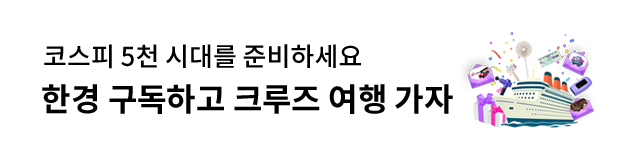그러나 원래의 글자 의미 중 하나는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열쇠’다. 왕조시대에 장관(掌管)이라는 직무가 있었다. 문을 열고 닫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있던 시절 막대기(管)로 그를 푸는 직업에 종사했던 벼슬이다. 요즘 말로 풀면 수문장(守門將)이다.
옛날 수레에도 바퀴가 달렸다. 차축(車軸)의 양쪽에 바퀴를 걸어야 수레가 움직인다. 바퀴에 차축을 고정시키는 데에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다. 차축 양쪽에 금속으로 만든 덮개를 두른 다음 이를 차축에 뚫은 구멍에 고정시키는 방식이었다.
덮개와 차축에 난 구멍에 단단하면서도 길쭉한 철심(鐵心)을 꽂아 넣어야 했는데, 이 조그만 장치가 바로 할(轄)이다. 자동차로 말하면 바퀴를 몸체에 단단하게 밀착하도록 하는 타이어 고정 볼트다.
‘투할(投轄)’이라는 고사(故事)가 있다. 서한(西漢) 때 술을 좋아했던 진준(陳遵)이라는 사람은 손님들이 집에 돌아가 흥이 깨지는 상황을 싫어했다. 그래서 집에 온 손님들의 수레에서 이 할을 뽑아 우물에 던졌다는 내용이다. 손님과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다.
관과 할이라는 두 종류의 장치를 합쳐 만든 말이 관할(管轄)이다. 지금은 행정의 개념으로 굳어졌지만 사실은 ‘열어서 움직이다’는 뜻의 管(관)과 ‘멈춰서 고정시키다’는 轄(할)의 합성이다. 따라서 ‘나아감과 멈춤’의 進退(진퇴)와 行止(행지)의 새김이다.
나아갈 때 제대로 나아가야 하고, 멈출 때 또한 제대로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의 명맥이 걸려 있는 북한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투명한 요소에 큰 기대를 걸다가 안보의 초석(礎石)을 흔들 우려도 없지 않다. 나아갈 때 나아가되 멈출 때는 단호하게 멈추는 전략적 행보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유광종 <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