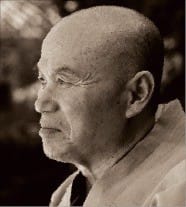
본명이 이영주인 성철은 1912년 경남 산청군에서 태어났다. 19세에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5년 뒤인 1936년 출가해 해인사 백련암에 있던 하동산 스님을 은사로 모셨다. 성철은 혹독한 고행과 엄격한 자기 수행을 강조했다. 그는 문경 대승사와 봉암사에서 눕지 않고 좌선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8년간 했다.
성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세속화된 한국 불교를 비판하며 수행과 참선을 강조했다. 그는 “중 보러 절에 가지 말고 네 마음속 부처를 찾으라”고 일갈했다. 1981년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대중에게 내린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말이 됐다.
성철은 ‘단번에 깨친다’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지향했다. 불교의 세속화를 우려해 승려의 현실 참여를 경계했으나, 불교계가 신군부의 탄압을 받은 1980년 10·27 법난과 1987년 6월 항쟁 때도 침묵해 현실 도피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가 입적하며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참선 잘 하그래이”였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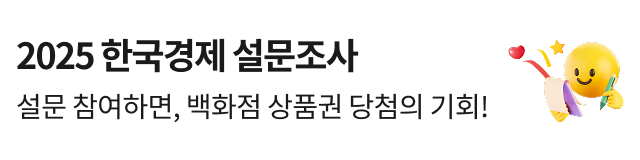



![시진핑 경주 방문 소식에…"푸바오 돌아와" 외친 푸덕이들 [APEC 2025]](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ZN.4221913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