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편의점 등 무인화·자동화 빨라지나

◆물류 등 인프라 빠르게 자동화

물류, 배송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 ‘자동화 진도’가 가장 빠르다. 국내 대형마트 대부분은 이미 상품 주문의 80~90%를 자동으로 하고 있다. 과거엔 사람이 일일이 재고를 파악해 필요한 상품을 전화로 주문했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
‘사람 없는 점포’도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확산 중이다. 이마트24는 서울 코엑스점, 성수점 등 본사 직영 점포 일부에서 무인 계산대를 운영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5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에 첫 무인점포를 열었다. 롯데슈퍼도 4월 서울 대치점에 처음 무인 계산대를 도입했다.
◆프랜차이즈도 무인화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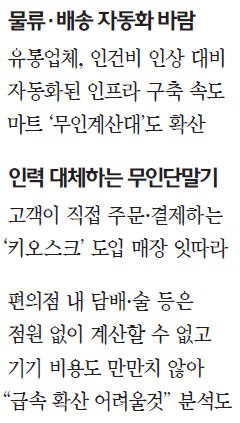
맥도날드도 전국 440개 매장 중 190곳에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주문시간을 줄여 매출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건비 감소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당 설치 가격은 700만~800만원 선이다. 롯데리아의 경우 평균 약 10%의 인력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한다. 외식업계에도 키오스크 도입 사례가 많다.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토니버거와 남다른감자탕S, 덮밥&이자카야 바베더퍼, 퓨전 국수 전문점 국수시대, 하노이 쌀국수 전문점 포세븐 등이다.
스타벅스는 모바일 주문 시스템을 도입, 인건비 감소효과를 보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사이렌오더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매장 반경 2㎞ 내 거리에서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미리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매장별로 최소한의 인력만 두면 된다.
◆자영업자 자동화 투자 큰 부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선 무인화, 자동화가 필요하지만 급격히 확산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자영업자들에겐 자동화를 위한 투자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반감도 크다. 일부 편의점 무인 계산대는 이용률이 높지 않다. 익숙하지 않은 데다 직접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담배 술 등은 소비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해서 무인 계산대를 이용할 수 없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상품에 전자태그(RFID)를 달면 계산이 훨씬 편해져 무인 계산대 이용률이 확 높아지지만 비용이 더 올라가 아직은 도입하기 힘들다”며 “기술적 한계 탓에 최소 5년 내 무인점포가 크게 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이 인력 감축에 나설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란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기업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재광/이유정 기자 ahnjk@hankyung.com


!["휴대폰 수리비 보험 청구했다가…" 낭패 본 사연 [보험AtoZ]](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99.3322036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