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 많고(石多), 바람 많고(風多) 여자 많은(女多) 삼다도(三多島). 돌은 한라산의 화산활동 때문에 많아졌다. 집 벽체와 울타리, 올레, 잇돌(디딤돌), 밭담, 어장도 모두 돌이다. 길돌 구들 위에서 태어나 산담 작지왓(자갈밭) 묘에 묻힌다는 말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온통 돌밭이다. 바람이 많은 것은 태풍 때문이다. 계절풍이 지나는 길목인 데다 샛바람(남동풍), 마파람(남풍), 갈바람(서풍)이 세차게 불어제친다. 돌울타리를 쌓고, 나직한 지붕을 새(띠풀)로 얽어매며, 돌담으로 밭울타리를 두른 것도 이 때문이다.
여자가 많다는 건 통계가 아니라 직관 때문이다. 산과 들, 바다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노출된 데서 나온 말이다. 남자들이 조난 당하는 경우가 많아 여자들이 일터로 나와야 하는 비극적인 역사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물속 20m까지 오르내리는 제주 해녀의 억척스러움이 만들어낸 이미지다.
제주는 삼무(三無)의 섬으로도 불린다.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다는 얘기다.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느라 근면·절약·상부상조를 미덕으로 삼았기에 도적질하거나 구걸하지 않고 집에 대문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 좁은 섬 안에서 서로 아는 처지라 나쁜 짓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대문 대신에 외출 여부를 알려주는 긴 나무(정낭)를 걸쳐두는 게 고작이었다. 이것이 곧 ‘정낭의 미덕’이다.
원래 제주 삼다는 풍다(風多), 수다(水多), 한다(旱多)를 의미했다. 바람과 비가 많고, 현무암 토양 탓에 가뭄이 심해서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말로 삼재(三災)를 뜻한다. 조선 세종 때 ‘제주 삼다’의 어려움을 들어 납세를 면해줬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삼다는 제주의 어려운 환경을 집약하는 말이고, 삼무는 고난 위에 구축한 성취의 상징이다.
그런데 웬일인가. 올해 인구 대비 범죄율을 보니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절도와 아동성폭행이 1위, 살인이 2위다. 자랑스런 ‘삼무의 전통’은 어디 가고 수치스런 ‘삼죄(三罪)의 오명’이라…. 낯선 사람이나 외국 관광객이 급증한 탓일까. 정낭이 사라진 자리에 대문이 들어서고, 밭일 나가는 아낙의 허리춤에 열쇠가 달랑거리는 이유 또한 그런가.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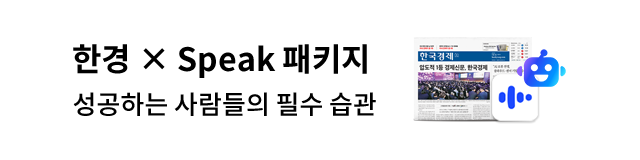
![[이성득의 ASEAN 돋보기] 트럼프發 관세 전쟁에 긴장하는 ASEAN](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Q.39719290.3.jpg)
![[비즈니스 인사이트] AI 패권 경쟁…추격자 아닌 선도자 돼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2059514.3.jpg)
![[고승연의 경영 오지랖] 위기의 시대, 리더의 책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969962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