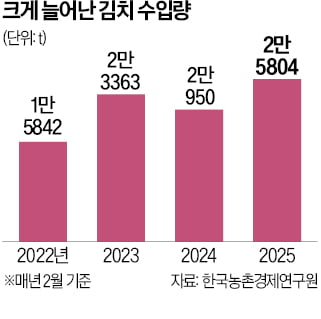누가 뭐래도 환경부는 '마이웨이'
대통령의 '개구리론' 흘려들었나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그렇다. 선진국도 나라 경제가 망가지겠다며 서둘러 후퇴한 정책이다. 그걸 선진국 문턱도 못 넘어선 한국이 왜 밀어붙이는 건지.
환경부는 최근 배출권 거래제 설명회를 열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1월1일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며 배출권 할당 지침 등 6개 세부 지침을 일방적으로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자체도 그렇지만 할당량을 결정한다면서도 당사자인 업계를 배제한 채 모든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기업들만 불만이 아니다. 얼마 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목표의 비현실성을 비난했다고 한다. 환경부와 환경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배출량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나라는 의무 감축량을 달성한 기업이나 나라가 내놓은 초과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년 기준으로 30%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참 훌륭한 구상이다. 그런데 박수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왜일까.
‘마이웨이’ 탓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자. 미국은 일찌감치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온실가스 종말론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명제에 기업 경쟁력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토의정서 주도국이라던 일본도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8% 줄인다는 새 목표를 설정했다. 언뜻 보기엔 야심찬 계획 같지만 그렇지 않다. 1990년 대비 25% 감축 목표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이어서다.
유럽연합(EU) 역시 올초 새 목표를 내놓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4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고강도 감축안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10년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회원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부과하지 않았다. 전혀 구속력 없는 목표라는 얘기다. 교토 메커니즘의 핵심이라는 EU 탄소시장은 배출권 가격 급락으로 회생 불능 상태다. 호주는 2012년 멋모르고 배출권 거래제를 뛰어넘어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부과했다. 그 제도가 오는 7월1일 폐지된다. 기업들이 죽어나고,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다.
이렇게 교토의정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 그 휴지 조각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그렇다.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신규 구매차량에 최대 7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대신 배출량이 적은 차종에는 보조금을 준다는 제도다. 당연히 환경친화적이다.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내는가. 부담금이 보조금의 25배나 되니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피해를 보는 구조다. 게다가 혜택은 친환경 차량에 강한 수입차가 본다.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갑을 뒤져 외국 기업을 돕겠다는 환경부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등 쉴 새 없이 산업을 압박하는 환경 정책 탓에 기업들은 이미 기진맥진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냥 호수에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오가는 것처럼 규제가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 심각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환경부 귀에는 박 대통령의 ‘개구리론’도 ‘바담 풍’으로 들린 모양이다.
환경부 장관은 작년 종무식에서 이런 송년사를 했다. “화관법 등의 개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했고, 원주청 대구청에 화학물질관리과를 신설했을 뿐 아니라, 신설된 6개 정부합동방재센터를 우리 부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관피아’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겠는가. 올 연말에는 또 어떤 송년사가 나올지, 궁금하다.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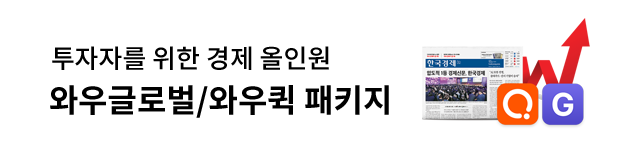
![[한경 에세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9691829.3.jpg)
![[김동욱 칼럼] 정주영을 정몽주로 기억하는 사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14342445.3.jpg)
![[천자칼럼] 한국만 금값인 택시 면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8417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