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병상에 누운 경제학자 하이에크, 무릎친 사건…"베를린 장벽 무너졌다고? 내가 뭐랬어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사상사 여행 / 민경국 지음 / 21세기북스 / 360쪽 / 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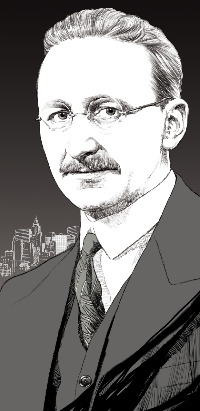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병원 병상에 누워 있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한 말이다. 그는 ‘자생적 질서’를 강조했다. 언어나 관습처럼 시장경제에서도 자생적으로 질서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빈곤, 실업, 저성장 등 경제 문제는 물론 1930년대 대공황까지도 정부 개입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사상사 여행》은 애덤 스미스를 시작으로 하이에크에 이르기까지 51명의 대표적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사상과 시사점을 정리한 책이다. 2012년 9월부터 1년 동안 한국경제신문에 연재한 ‘민경국 교수(사진)와 함께하는 경제사상사 여행’을 엮어냈다.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수많은 경제사상가들이 겪어야 했던 빈곤, 실업, 성장, 위기 등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제사상을 역사적으로 읽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책은 18세기 스미스, 맨더빌, 흄 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어떻게 경제학을 만들었는지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자유주의 경제학을 통해 인류의 밝은 미래를 예측했고 이런 낙관주의는 칸트, 세이 등을 통해 세계로 확산됐다.
![[책마을] 병상에 누운 경제학자 하이에크, 무릎친 사건…"베를린 장벽 무너졌다고? 내가 뭐랬어 !"](https://img.hankyung.com/photo/201402/AA.8412854.1.jpg)
20세기 중반 이후 몰락한 자유주의 경제학을 부활시키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중심에는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가 있었다. 1980년대 친시장개혁과 1989년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은 부활에 성공했다.
![[책마을] 병상에 누운 경제학자 하이에크, 무릎친 사건…"베를린 장벽 무너졌다고? 내가 뭐랬어 !"](https://img.hankyung.com/photo/201402/AA.8414113.1.jpg)
저자는 ‘미래를 위한 경제학’으로 오스트리아학파를 꼽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20세기 중반 생겨난 사조로 자유주의 경제학을 재구성해 당시 지배적이던 사회주의와 간섭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지적 무기가 됐다. 이 학파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는 하이에크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로버트 노직 등도 이 학파의 대표적 학자들이다.
하이에크는 ‘지식의 한계’라는 인식론과 자생적 질서이론으로 자유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제 문제는 희소한 자원 배분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핵심이다. 인간의 두뇌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시 세계로까지 분업과 협력을 확대하려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지식 소통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일종의 거대한 ‘소통 시스템’인 셈이다.
저자는 “경제 자유를 보장해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학은 현실을 설명할 수도 없고 정책적으로 실패한다”며 “오스트리아학파는 그런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