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리시스 1·2
제임스 조이스 지음 / 이종일 옮김
문학동네 / 708·712쪽│각 2만5000원

최근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제임스 조이스의 고전소설 <율리시스>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다. 어렵기로 유명한 책이기에 “읽을 만하다”는 말은 극찬에 가깝다.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선 벌써 입소문이 나며 초판으로 찍은 1·2권 2000질 가운데 약 1000질이 출간 한 달 만에 팔렸다.
책은 이종일 전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사진)가 번역했다.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장을 지낸 조이스 전문가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1998년 가을부터 조금씩 번역을 시작했는데 출간까지 25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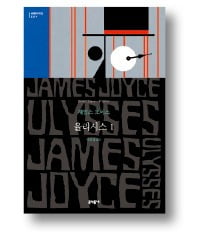
그는 이 소설이 “코믹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의 우울한 하루를 그린 작품인데, 작가가 그런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말장난도 하면서 코믹하게 희극적으로 풀어내죠.”
20세기 초 더블린 소시민의 사소하고 구체적인 일상을 있는 그대로 실감 나게 전달하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블룸이 아침 먹고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 일을 보는 모습까지 나와요. 힘을 주었다가 푸는 등 아주 세세합니다. 당시는 위선적이다 싶을 만큼 점잔을 떨던 시대였어요. 참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쉽게 번역했어도 <율리시스>가 쉬운 책은 아니다. 조이스는 생전에 “내가 불가해한 것과 수수께끼를 워낙 많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장차 수백 년 동안 교수들이 내가 뭘 의미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할 텐데, 이야말로 자신의 불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농담조로 말한 적이 있다. 이 전 교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원래 어려운 작품이라고 편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주목! 이 책] 빌어먹을 양자역학](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A.35613139.3.jpg)
![[주목! 이 책] 시간의 길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A.3561313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