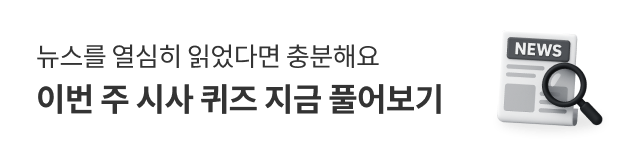보잉 BR&T, 韓언론 최초 방문
세계 12곳 센터 연구원 4800명
'1마일당 3달러' 드론 개발 한창
조비, SKT와 서울·제주 운항 추진

BR&T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세계 12곳에 센터를 두고 있다. 연구원만 4800명에 달한다. 패티 창치엔 BR&T 부사장은 “매년 연구개발(R&D)에 40억달러(약 5조4240억원)를 쏟고 있다”며 “자율비행이 핵심 연구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보잉, 3달러에 1.6㎞ 가는 자율비행 노려
보잉은 지난 5월 미국 자율비행 도심항공교통(UAM) 스타트업인 위스크에어로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처음부터 조종사가 필요 없는 자율비행 서비스를 내놔 시장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전략이다.위스크에어로는 최근 자율비행이 가능한 6세대 UAM 기체를 공개했다. 양쪽 날개에 프로펠러와 모터가 12개씩 달린 신형 기체는 15분 충전만으로 최대 90마일(약 144㎞)을 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전방 프로펠러 6개가 앞으로 기울어지도록 설계해 방향 전환 시 속도 증가, 소음 저감, 항속거리 증가 등의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보잉은 배터리 경량화도 UAM 경쟁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벼우면서도 한 번 충전에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배터리야말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지름길이다. 위스크는 1마일(1.6㎞)당 3달러(약 4300원) 수준으로 요금을 맞추는 게 목표다. 창치엔 부사장은 “배터리를 경량화하고 배터리 셀 안전성을 높이는 일은 모든 UAM 기업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자율비행 UAM은 해결해야 할 다른 난제도 수두룩하다. 동체가 도심 상공에서 비상 추락할 경우 인공지능(AI)이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위스크에어로가 규제 기관과의 소통에 익숙한 보잉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조비 “2년 뒤 美 상용화…제주도도 가능”
상용화 경쟁에서 가장 앞선 건 미국 조비에비에이션이다. 승차공유 방식으로 비행택시 서비스를 2025년 내놓는 것이 목표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상업 비행 허가 절차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운항 인증 서류를 지난 7월 제출했다. 미국 UAM 업체 중 사업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달 미국 공군에 UAM 기체도 납품했다.조비는 전력 효율화를 위해 배터리를 자체 설계했다. 최대 전력은 236㎾ 수준이다. 조비 UAM 기체와 비슷한 무게(약 1950㎏)의 테슬라 전기차 ‘모델S 플레드’의 두 배에 해당하는 출력이다. 조비 기체의 또 다른 강점은 소음이다. 머리 위를 날아가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다. 조비는 다양한 기체 디자인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소프트웨어로 실험한 결과 기울임이 가능한 프로펠러를 앞날개에 4개, 뒷날개에 2개 장착하는 게 소음 억제와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에릭 앨리슨 조비에비에이션 부사장은 “일부 프로펠러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비행이 가능하다”며 “소음은 300~400m 높이 상공을 날 때 지상 기준으로 45데시벨(dB)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다. 조비는 SK텔레콤과 협업해 내년 한국에서도 운항 검증을 추진한다. 앨리슨 부사장은 “운항거리인 160㎞ 내라면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주에도 UAM을 띄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