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동영상 송출 서비스 출시
고객사 확대…연내 유럽 진출
"SaaS 분야 토종기업 늘어나야"

휴대폰 안에 구독형 앱 하나쯤은 존재하는 시대다. 하지만 기업 간 거래(B2B) 분야에서 ‘토종 SaaS’를 찾기는 쉽지 않다. 실리콘밸리 최초로 한국계 유니콘 기업이 된 센드버드도 창업 초기엔 국내 기업과 투자사의 외면 속에 미국행을 택했다. LG유플러스의 전신인 데이콤과 국내 최초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업체 씨디네트웍스의 부사장을 거친 김형석 카테노이드 대표(사진)는 17년간의 직장생활을 뒤로하고 창업에 뛰어들어 12년을 버텼다.
김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토종 B2B SaaS 창업이 더 늘어야 한다”는 지론을 강조했다. 척박한 환경에서 버티고 버텨 베테랑으로 남은 그가 업계에 던지는 제언이다.
그는 SaaS 업체의 성장세와 국민소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국민소득은 개발자 몸값을 가늠하기 위한 일종의 대체 지표다. 시장이 크다고 SaaS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중국과 미국의 SaaS 분야 투자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발자 몸값 때문”이라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인건비가 늘면 외부 SaaS에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업자 이동 비용’이다. 그는 “특히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시스템이 등장해도 함부로 바꾸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카테노이드는 기업이 동영상을 모바일·웹에서 원활하게 송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한다. 동영상 변환 기능, CMS, CDN을 한데 묶었다. 주로 광고 영상이 중요한 커머스 업체와 인터넷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교육 업체 중심으로 고객사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해지율이 극소수였고, 후발주자가 영업을 뚫어내기 어려운 시장 특성을 고스란히 느꼈다는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미국 업체를 중심으로 커진 이유는 토종 SaaS 기업이 부족해서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일본과 EU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두고 “미국 기업의 놀이터가 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EU가 최근 정보기술(IT) 규제의 핵심지로 떠오른 것도 미국 업체에 자국 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도 대입할 수 있다. 김 대표는 “한국 개발자 몸값이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반 토막이 될 리는 없다”며 “외산 SaaS의 진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창업 기회가 분명한 영역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테노이드의 올해 매출 목표액은 200억원이다. 최근엔 ‘노코드’ 기반의 숏폼 동영상 송출 서비스 ‘찰나’를 내놔 고객사를 늘리고 있다. 시리즈C 투자까지 받았으며 누적 투자 유치액은 275억원 상당이다. 연내 주요 목표는 유럽 시장 진출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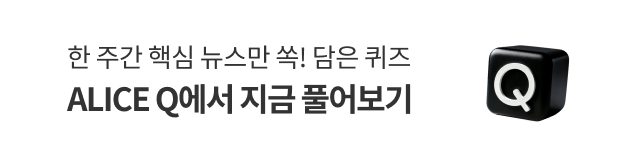

![침으로 우울증 진단, 3D 프린터로 안경 제작…"우리가 미래 유니콘" [긱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80550.3.jpg)
![100대 유니콘 중 17곳 韓 사업 힘들어 [긱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A.34076561.3.jpg)
!["동네 학원 교재 저작권료 부담 낮춰"…'쏠북' 운영 북아이피스, 58억원 유치 [긱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A.3407656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