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에 AI를 기반으로 신약을 만드는 스탠다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약 개발사임에도 실험실이 없다. 대신 자체 개발한 AI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신약 후보군을 생성하고 선별해 최종 후보물질을 찾는 게 특징이다.
스탠다임의 플랫폼 기술은 4가지로 구성돼 있다. 기존의 약물을 재창출하는 '스탠다임 인사이트' 질환에서 표적을 발굴하는 '스탠다임 애스크' 표적에서 유효물질을 창출하는 '스탠다임 퍼스트' 분자구조를 학습해 신약후보물질을 찾는 '스탠다임 베스트' 등이다. 윤소정 스탠다임 이사는 "기반 기술을 이용해 비알콜성지방간(NASH), 파킨슨병 등 26가지 신약후보물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로노이는 화합물 설계, 합성부터 임상 후보물질 도출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에 AI을 접목해 개발기간을 경쟁사에 비해 대폭 단축하고 있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AI에 기반한 자체 연구개발 플랫폼 ‘보로노믹스’ 가동을 본격화 해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LG화학도 AI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에 꾸준히 집중하고 있다. 올 들어 항암제 개발 프로그램의 화합물 도출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신약 개발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AI가 바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데이터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것은 주의해야할 점이란 지적이다. 곽영신 LG화학 신약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너무 큰 주제를 AI에 맡기기 보다는 작더라도 문제를 해결했을 때 큰 임팩트를 주는 내용을 AI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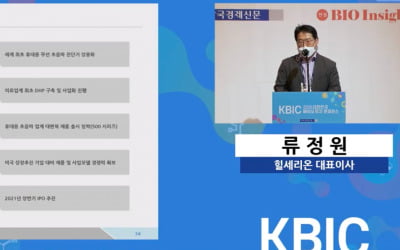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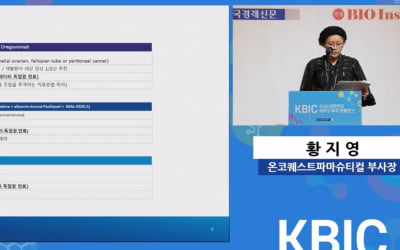



![[단독] 석유公 "액트지오가 맞았다…메이저사 투자 의향 강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557048.3.jpg)
